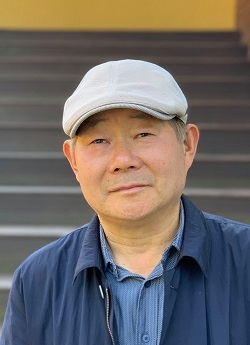
1940년대 초의 어느 가을날, 참빗 제조 명가인 ‘고 영감네’ 집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빗 장사 나갈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대나무로 짠 커다란 고리짝에다 그동안 만든 참빗을 차곡차곡 쟁여 넣는데, 멜빵이 달린 그 고리짝 하나에 1500여 개 남짓이나 되는 빗이 들어간다.
-행주야, 아부지 따라서 빗 장사 나가야 하는디 싸게 안 나오고 뭣하고 있어!
-이번에도 쩌그 만주 어디로 간담서, 열 살도 안 된 애기를 긴사코 데꼬 가야 쓰겄소?
-명색이 참빗 명가의 후손인 바에, 맹그는 것만 갈쳐서 되간디. 장사하는 것도 배와 둬야제.
어린 행주가 아버지 고씨를 따라서 원거리 장삿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덟 살 때던가 처음으로 만주에 빗 장사 가는 아부지를 따라나섰던 것 같아요. 나야 워낙 어렸으니까 만주가 어딘지 신의주가 어딘지 모른 채로 아부지를 따라서 기차를 탔지요. 한 번 가면 세 밤이나 네 밤을 자고 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해요. 어린 나한테 꼭 장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외아들이니까 떼놓고 가기 싫어서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백범 김구도 참빗 행상으로 위장하고서 국경을 넘어 만주 땅으로 건너간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백범일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청국(淸國)을 향하여 방랑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바로 전날, 나는 안 진사네 사랑에 갔다가 참빗장수 한 사람을 만났다. 나는 참빗을 사겠노라며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그의 인물 됨을 떠보았다. 이튿날 나도 참빗과 붓, 먹 등을 사서 둘이서 한 짐씩 걸머졌다.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의심받지 않고 청나라(중국)로 건너가기 위해서, 백범이 참빗장수로 변장을 했었다는 얘기다. <백범일지>에 등장하는 그 참빗장수는 남원에서 올라가는 사람으로 돼 있다. 당시 남원은 대나무가 아닌 일반 목재를 깎아 만든 얼레빗의 대표적인 생산지였다. 그 시절엔 만주의 상인들이 담양의 향교리까지 와서 빗을 사가기도 했다는데, 아마도 그 빗장수들은 담양에서는 참빗을 사고, 남원에서 얼레빗을 사서 장삿길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잠깐, 여기서 고행주씨로부터 참빗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빗을 나타내는 한자가 ‘빗 소(梳)’자인데 우선 크기별로 분류하면 큰 빗은 대소(大梳), 중간 크기는 중소(中梳), 그보다 작은 것은 어중간하다고 해서 어중소라고 해요. 그리고 가느다란 무명실인 양사(洋紗)로 아주 촘촘하게 엮은 빗을 ‘얼굴 면(面)’ 자를 써서 면소(面梳)라고 하는데, 머리를 올려서 상투를 묶고 나면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남아 있는 털을 빗는 빗이에요. 면소는 빗살 간격이 0.3mm 정도로 빽빽하고….”
면소보다 더 촘촘하게, 0.2mm 정도 간격으로 엮은 빗이 서훌치다. 머릿니의 알을 서캐라고 부르는데 ‘서캐를 훑어낸다’고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 써훌치라고도 했다.
고 영감네 참빗을 떼 가지고 만주에 행상을 다녀온 상인이 다시 고 영감네 집에 들었다.
-이번에 우리 집 참빗 갖고 만주 댕게 왔다듬만 어째 재미 좀 봤능가?
-예. 갖고 간 빗은 다 폴고 왔는디…영감님, 짐승들 털 빗기는 빗은 맹글 수 없소?
-뭔 소리여? 짐승들 털을 빗기다니?
-만주에 갔듬만 중국 사람들 하는 말이, 즈그들이 키우고 있는 말하고 양들의 털을 빗기는 빗을 조깐 맹글 수 없겄느냐고 물어보드랑께요. 빗으로 빗으면 가축들 몸에서 이하고 진드기하고 이런 것들이 훑어져 나올 것인디….
-기냥 참빗으로 빗으면 될 것 아니라고. 따로 맹글고 말고 할 것이 뭐 있어?
-아, 이 사람들이, 짐승 몸에서 훑어낸 그 이하고 진드기를 빗에다 올려놓고 죽여야 쓰겄응께, 참빗 끝에다 특별히 납작한 나무를 덧대서 맹글어 갖고 오면 즈그들이 비싸게 사겄다고 하드랑께라우.
여태까지 그런 빗은 없었다. 하지만 담양 향교리의 빗 만드는 장인들은 그 용도에 맞는 빗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름도 ‘오랑캐 호(胡)’자를 써서 호소(胡梳)라고 지어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