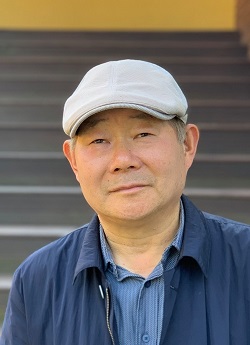
담양의 참빗 명가인 고영감네 집에서 빗 만들기 작업이 한창이다. 대나무를 쪼개 빗살을 만드는 과정은 이미 소개했거니와, 그 다음 공정은 ‘빗매기’다. 실로 빗살을 엮어 매는 작업이다. 참빗 명인 고행주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가늘게 쪼갠 빗살을 규격에 맞춰 미리 토막을 내서 준비를 해뒀을 거 아녜요. 그 빗살 토막들을 삼합사로 조르라니 엮어나가는데 한 줄, 두 줄, 석 줄로 엮어요. 참빗 하나에 보통은 120토막의 미세한 빗살이 소요되는데…아, 그거 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빗살 엮는 작업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과정을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란 더욱 어렵다.
먼저 ‘작업 판’에다가 잘게 쪼갠 대나무 살로 세 쌍의 기둥을 세운다. 그런 다음 빗살 토막을 집어서 그 기둥들 사이에다 끼운 다음, 실로 기둥과 빗살을 번갈아 감아가면서 엮는 식이다. 삼합사로 엮는다고 했는데, 삼합사(三合絲)란 세 올로 꼰 삼겹의 실을 말한다. 엮어나가는 실의 굵기가 바로 빗살과 빗살의 간격이 되기 때문에, 실이 가늘수록 빗살이 더욱 촘촘한 참빗이 되는 것이다.
여남은 살 고행주 어린이가 골목길을 달려가다가 멈춰서더니 괴춤을 까 내린다.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야단을 친다.
-행주야! 너 시방 거그서 뭣을 할라고 그라냐!
-오줌이 마려워서…
-이놈아, 오줌을 집에 가서 눠야제, 길거리에서 뭣하는 짓거리여!
어머니가 아들을 야단치는 이유는, 아무 데서나 바지춤을 내리고 소변을 보다가 남들 눈에 띌까 두려워서만이 아니다. 비료가 귀하던 시절, 농촌의 아이들은 놀이터에 놀러 갔다가도 소변이 마려우면 자기 집까지 일삼아 달려와서는, 마당 가에 놓여있는 오줌통에다 일을 보아야 했다. 참빗 만드는 집안의 아이들이야말로 소변만은 꼭꼭 집에서 보아야 했다. 빗을 염색하는 데에 오줌이 요긴하게 쓰였기 때문이다.
“우리 집 마당 한쪽에 화덕이 있고 그 화덕 위에 높이가 1m쯤 되는 양철통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 통이 빗살을 염색하는 염색통이지요. 염색통 밑바닥에다가는 ‘호장근’이라는 풀뿌리를 넣고, 실로 엮은 빗살들을 그 위에 얹은 다음에, 빗살이 푹 잠길 만큼 사람의 오줌을 퍼다 붓고 장작불을 때서 끓입니다. 호장근에 맹물을 붓고 끓이면 색깔이 별로예요. 역시 오줌을 붓고 푹 끓여야 색깔이 곱게 나와요.”
호장근(虎杖根)은 중국에 많이 분포한 여러해살이풀인데 뿌리가 약재로도 쓰였기 때문에, 참빗 만드는 사람들은 한약방에서 그 풀뿌리를 사다가 염색 원료로 사용하곤 했다. 어쨌거나 오줌을 부은 염색통에다 실로 엮은 참빗의 빗살을 넣고, 무려 여덟 시간 남짓 동안이나 불을 때야 했다는데, 통속에서 새나오는 냄새가 고약하기 짝이 없었다.
호장근 뿌리와 오줌을 넣은 염색통에서 빗살을 푹 삶은 다음에는, 졸아붙은 오줌물을 모두 퍼내고 대신 잿물을 붓는다. 잿물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볏짚을 한 단쯤 태운 다음에 그 재를 물에 타서 만든 것이다. 드디어 잿물에 헹군 빗살을 꺼내면, 불그스름한 색으로 속까지 물든 참빗의 색깔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1950~60년대에 우리가 사용했던 참빗은 모두 그렇게 오줌물에 삶아서 염색한 제품이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염색과정이 끝난 빗살을 햇볕에 말린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등대 붙이기’ 작업이다. 등대란 참빗의 한 가운데 붙이는 대나무를 일컫는다. 모양내기 좋아하는 우리 조상들이, 밋밋한 댓가지 그대로를 갖다 붙였을 리가 없다.
“대나무 끝을 연필처럼 뾰죽하게 깎은 다음에 거기다 청강수를 찍어 묻혀서 등대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화롯불을 쐬고 나면 청강수 묻은 데가 타가지고 그림 모양이 나타나요.”
고행주씨가 얘기하는 청강수(靑剛水)란 염산을 말한다. 뾰족한 댓가지에 염산을 묻혀서 등대에 대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화롯불에 얹어놓으면, 그 염산이 타면서 등대에 문양이 새겨진다는 얘기다. 그나마 서민들이 사용할 싸구려 빗의 등대에는 그런 식으로 대강 문양을 해 넣었으나, 대갓집 귀부인들이 사용할 고급 제품의 경우 문양 새겨 넣는 방법이 또 달랐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