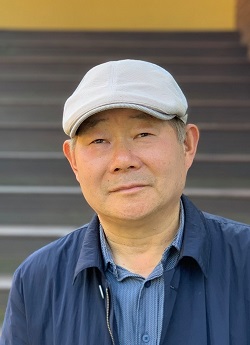
일제 강점기이던 1940년대 초의 어느 봄날, 담양읍 향교리 고 영감네 집.
-행주야! 아, 싸게 안 나오고 뭣 하고 있어!
아침밥을 먹고 난 고 영감이 외출 채비를 한 다음, 어린 행주를 불러댄다.
-뭣 땜시 아침부터서 행주는 불러 쌌소?
부인이 별일이다 싶어 그렇게 물었는데, 고 영감은 다 계산이 있다,
-오늘이 담양 장날 아녀. 고놈 데리고 대나무 사러 갈라고 그라제.
-참 벨일이요이. 대나무 사러 가는디 행주는 왜 데꼬 갈라고…
-아, 우리가 농사지을 땅뙈기가 있어, 뭣이 있어. 고놈한테도 참빗 맹그는 것이나 일찌감치 갈쳐놔야제. 행주야, 빨리 안 나올 것이여!
이윽고 작은방의 문이 열리고, 입술이 서 발이나 나온 행주가 토방 마루를 내려선다.
여남은 살에 불과하던 소년 고행주가, 참빗 만들 대나무를 사러 가는 아버지를 따라 담양장터로 향한다. 참빗 제조 명가로서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한 첫 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담양장에서는 완성된 죽제품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었다. 각지에서 실려 온, 대나무 원목을 거래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 대나무를 실은 트럭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
-대나무 트럭 들어온다! 이번에는 경상도 대나무구먼.
-저리 조깐 비켜보랑께. 나도 몇 다발 사야 쓰겄응께.
-이 사람이 왜 밀고 이래! 내가 몬침 꼬랑지 분질러 놨는디.
-뭔 소리여. 여그 뻘건 헝겊으로 꼬리표 붙여놓은 것 안 보여!
“대나무 원목을 실은 트럭이 장터로 들어오면 참빗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자리 하는 사람, 바구니 하는 사람 할 것 없이 몰려들어요. 트럭에 실린 대나무 다발을 이리저리 살핀 다음에 꼬랑지를 분질러 놓거나 미리 준비해온 뻘건 헝겊을 대나무 다발의 꼬리에다 묶어놔요. 자기가 사갈 대나무니까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말라는 표시를 해둔 거지요.
-어이, 여그 있는 다섯 다발은 내가 갖고 갈 것이구먼.
-잘 골랐네. 참빗 맹그는 대나무로 딱 맞겄소. 대나무 값 치르고 얼릉 가져가드라고.
-지난번 외상값은 오늘 갚어 줄 것잉께, 오늘 댓값은 한 번 더 외상으로 하세.
-아이고, 대나무 값 그거  푼이나 한다고 또 외상을 하자고 그래?
푼이나 한다고 또 외상을 하자고 그래?
-누구는 외상을 하고 싶어 한당가. 헹펜이 어려웅께 그라제.
상인이 트럭 운전석에서 장부를 꺼내서는 거래 내역을 기입한다. 이제 가져가면 된다.
대나무 원목은 속(束) 단위로 거래됐는데, 굵기를 칫수로 따져서 세 치 대(竹)는 30개 묶음이 한 속이고, 네 치 대는 20개, 다섯 치 대는 열 개…하는 식으로 굵기에 따라서 한 속의 개수가 달랐다. 주로 세 치 대나 네 치 대는 바구니를 만드는 데 쓰이고, 참빗을 만드는 데에는 다섯 치 혹은 여섯 치 대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참빗은 그 모양도 작을 뿐 아니라, 빗살 자체가 아주 미세한데, 어째서 그처럼 굵은 대가 필요할까? 고행주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가느다란 대나무를 재료로 삼아서 참빗을 만들어 놓으면 차름한 맛이 없어요. 비포장 길 맨치로 미끈하게 안 보인당께. 굵은 대는, 대나무 등쪽이 면적을 넓게 잡으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재료로 만들어 놓으면 빗살이 탄탄하고 차름해요.“
고행주씨는 굵은 대를 재료로 써야 완성된 참빗의 모양새가 ‘차름하다’고 했는데 정갈하다, 찰랑거린다…등으로는 아무래도 설명이 좀 모자라는, ‘빗장이’의 언어다. 반대로 가는 대나무를 쓰면 굵은 대에 비해서 둥글어지는 각도가 급해서, 제품을 만들어놨을 때 빗살이 굽어지게 되어서 ‘차름한’ 맛이 안 난다는 것이다.
-아부지, 트럭에 실린 대나무를 한 번 딱 보고 어치케 경상도 대라는 걸 안다요?
드디어 여남은 살 고행주 어린이에 대한 고 영감의 ‘빗장이 만들기’ 교육이 시작된다.
-전라도 사람들은 대나무를 톱으로 짤르고, 겡상도 사람들은 도끼로 짤르그등.
-아하, 그랑께, 밑동 가운데가 새총맨치로 움푹 패인 것이 겡상도에서 온 것이구먼, 히히.
-아이고, 우리 아들놈 천재다! 그란디 첫날부텀서 너무 많이 배와뿔면 대그빡 터져 이놈아. 배고 픙께 일단 국밥이나 한 그릇씩 사묵자.
픙께 일단 국밥이나 한 그릇씩 사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