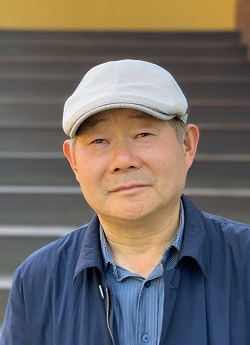
상점 간판의 경우 연필로 밑 글씨 작업을 미리 한 다음에 페인트로 각각의 글자를 그려나가는 방식이었으나, 현수막은 달랐다. 하얀 다후다 천을 길게 늘어뜨린 다음 글자 개수에 맞춰 사각형의 칸을 나눠 그리고서, 그 칸 안에 초성과 모음과 받침이 차지할 공간을 ‘마음속으로’ 분할해서 글씨를 써야 한다고 이강연씨는 설명한다.
현수막이야말로 좁은 간판 가게 안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다 기다랗게 펼쳐놓고 글씨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었다.
-얘, 영수야. 의, 심, 나, 면, 다, 시, 보, 고…그다음에 무슨 글자를 쓸지 너 알어?
-우리 교실 벽에도 붙어 있잖아. 수, 상, 하, 면, 신, 고, 하, 자…여덟 글자 딱 맞네 뭐.
당시 간판 가게에 현수막 주문을 의뢰한 쪽은 모두 공공기관이었다. 저축 장려나 가족계획, 혹은 산불 조심 따위의 표어들도 더러는 거리에 나부꼈으나, 가장 흔하게 걸려 있는 것은 반공 구호들이었다. 공공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닌 상업광고 현수막은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수막은 만드는 것도 간단치 않았지만, 공중에 매다는 일 또한 여간 번거롭지가 않았다.
보통은 도로 양쪽의 전봇대에다 끝을 묶어서 달았는데 1960~70년대에는 원목에다 시커먼 콜타르를 칠한 나무전신주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전신주를 붙들고 씨름을 하다 보면 옷이 엉망이 될 건 불문가지다. 게다가 찬 바람이 불거나 눈발이 날리는 겨울철엔 정말 고역이었다.
그런데 간판 업자들에게도 호황기 혹은 불황기가 따로 있었을까? 이강연씨로부터 들어보자.
“태풍이 불어닥쳐서 거리의 간판이 파손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간판 업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도, 대천처럼 바닥이 좁아서 누가 누군지 훤히 알고 지내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손해예요. 간판을 새로 해달라는 사람보다 망가진 간판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더 많거든요.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봉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간판 일을 하면서 가장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IMF 때였어요.”
지난 IMF 구제금융 사태 때 간판 업자들은 드물게 호황을 누렸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자 다시 불황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고육지책이겠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기존에 하던 장사를 접고 업종을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우리야 간판을 주문받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요. 하지만 새로 시작한 장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며 가며 그 가게에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1990년대에 들어서자, 간판 그리는 솜씨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텨온 이강연씨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맞닥뜨렸다. 간판 제작 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오랫동안 밥줄이었던 페인트 붓을 더는 써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컴퓨터에 간판의 사양만 입력하면, 거기 연결된 간판 제작용 기계장치가 알아서 척척 만들어 주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얘기가 그 대목에 이르자,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을 아들 이수욱씨가 녹음기의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컴퓨터로 간판을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간판의 가로세로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죠. 가령 가로 3미터에 세로 90센티미터라면 컴퓨터에 그 크기에 해당하는 네모 칸을 만들고, 그 안에다 글씨를 타이핑하는데, 글씨의 색깔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이수욱씨가 열을 올려 한참이나 설명을 했으나 문제는 인터뷰어인 내가 뭔 소린지 도통 알아먹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버지 이강연씨 역시 이 변화가 아직은 어리둥절하다.
“그동안 내가 만든 간판마다, 양철판 위에다 정성 들여서 가게 이름을 그려 넣고 나서, 완성된 뒤에는 그 한 귀퉁이에다 세필로 아주 작게 내 사인을 남겨두곤 했었는데….”
1948년생 이강연씨는 어찌할 수 없이, 함석 간판 그리던 그 시절이 그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