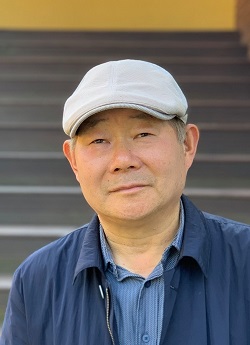
조수 생활이 1년 반이 넘어서자 간판 가게주인도, 이강연이 틈을 내서 글자 연습하는 것을 용인해 주었다. 그뿐 아니라 가끔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간판 작업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까다로운 기술은 글자에 그림자를 만들어서 입체감이 나게 만드는 작업이었다. 기술자의 마무리 작업을 지켜보던 이강연이 입을 벌리고 탄복한다.
-와, 삼-천-리-자-전-거…그 여섯 글자 가장자리에다 그림자를 그려 놓으니께 마치 자전거 여섯 대가…아니, 제트기 여섯 대가 간판을 막 뛰쳐나올 것 같다니께유.
“평면에다 글자만 그려놓으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글자 한쪽은 진하게 한쪽은 엷게 칠해서 입체감이 나게 만드는데요. 기술 좋은 사람이 잘 그려놓으면 참 멋져요. 물론 그런 간판은 정성을 더 들여야 하니까 값을 좀 더 받지요. 하지만 아무 간판이나 그렇게 그리는 건 아니에요. 양복 기지를 판매하는 ‘서울라사’라든가, ‘뉴-욕양화점’같은 구두 가게…이런 좀 고급스런 상점 간판들을 주로 입체감 살려서 그리지요. 가령 연탄집이나 쌀집이나 철물점 가게 간판을 그렇게 멋을 부려놓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어요?”
간판이 완성되면 상점으로 가져가서 설치까지 해줘야 간판장이의 임무가 끝난다. 요즘이라면 트럭에다 싣고 가면 간단하겠지만, 당시만 해도 영세한 간판 가게 형편에 그런 운반수단이 있을 리 없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앞뒤에서 나눠 들고 걸어가거나, 혹은 리어카에 걸쳐 싣고서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날라야 했다. 이강연씨의 증언에 의하면, 1960년대에는 보령군 대천면 소재지의 도로 주변 상점들은 대부분 초가집이거나 슬레이트집이었다.
-이봐, 이군! 사다리 걸치고 지붕으로 올라가 봐!
-사다리까지 놓고 올라갈 필요 있시유. 기냥 저쪽 담 딛고 올라가면 되겄구먼유.
조수가 담장을 딛고 훌쩍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간판의 위치를 잡는다. 그사이 기술자는 멀찌감치 물러서서 간판의 좌우 높낮이를 살핀다.
-오른쪽으로 쬐끔만 올려봐! 야, 이놈아, 네 오른쪽 말고 내 오른쪽 말이여! 아, 됐어! 됐으니께 인자 철사로 단단히 잡아매 봐!
간판 설치가 끝나면 누구보다 상점 주인이 기뻐했다. 허름하고 보잘것없던 가게도, 처마에다 새 간판을 척 올려서 단장하고 나면, 금세 상점의 품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서 1970년대에 접어들었다. 지방 소도시인 대천에도 제법 번듯한 가게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상가가 제법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강연도 어느 사이에 입체 글씨까지를 척척 써낼 정도로 기술이 익어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무개의 조수가 아니라 당당히 월급을 받는 간판 기술자가 된 것이다.
다른 직종도 대개 그러하듯이 기술자가 되고 나면,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야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이강연 역시 일단 천안의 ‘뉴-선전사’를 그만두었다. 그런 뒤에 바람도 쐴 겸. 부산에 있는 누이네 집에 놀러 갔다는데, 거기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실토한다.
“누이가 부산 구경시켜주겠다며 남포동 거리로 나를 데리고 갔는데,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간판들이 젤 먼저 눈에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그때까지 나는, 판판한 목판이나 양철판에다 페인트 붓으로 글자를 그리는 것, 그것이 간판의 모든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거리가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아크릴 상자 속에 형광등이 들어 있는…네온사인이라는 걸 첨 봤어요. 그래서 결심했지요, 기왕에 간판쟁이로 살아갈 것이면 밤에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저런 간판 만드는 기술을 배우자….”
말하자면 ‘평면’을 넘어 ‘입체’를, ‘색’을 벗어나 ‘빛’을 배우자,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온종일 간판만 쳐다보다가 누이네 집에 돌아오니 고개가 끊어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이강연은, 전날 봐두었던 어느 골목 귀퉁이의 간판집으로 무턱대고 찾아 들어갔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간판 기술자 필요한가 해서유.
-오, 그래요? 마침 기술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간판 일은 얼마나 했능교?
-어흠, 그러니께…솔찬히 오래 했구먼유.
취직,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