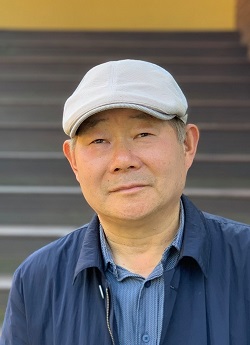
1966년의 어느 봄날, 충청도 보령군 대천 읍내 거리를 열여덟 살짜리 이강연이 코가 석 자나 빠진 표정을 하고서 터덜터덜 걸어간다. 모처럼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들어갔던 일자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때 맞은편에서 아는 얼굴이, 손에 페인트 통을 들고 다가온다. 동갑내기 동무 이성룡이다,
-어, 성룡이 너, 뼁끼통을 들고 시방 어디 가는 길이여?
-간판집에 뼁끼가 떨어졌다고 사오라고 혀서 심부름 갔다 오는 길이여. 그런데, 너 오늘은 부르도자 운전 조수 하러 안 갔어? 이왕 시작혔으면 열심히 배워보지 그랴. 그 기술 배우면 돈도 많이 번다든디.
-메칠 따라댕김서 가만히 살펴보니께, 부르도자 기사가 월급을 정해놓고 받는 것이 아니고, 작업 시간을 막 속이고 부풀려서 삥땅을 뜯어 묵드라니께. 그려서 아니다 싶어 그만둬버렸어.
이성룡이 페인트 통을 길가에 내려놓고서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제안을 한다.
-잘 됐다. 그라믄 너 간판 기술 한 번 배워볼래?
-너 일하는 태양사 간판집 말여? 너 말고 보조가 한 명 더 필요하대?
-아니. 우리 간판집 말고, 쩌그 ‘뉴 선전사’ 말여. 거그서 조수를 한 명 구한다드라니께.
-와, 잘 됐다! 내가 간판 그리는 일을 얼마나 배우고 싶었다고….
애당초 이강연은, 그 시기에 막 시골 마을에 등장하기 시작한 불도저의 운전 기술을 배우겠다며 한동안 조수로 따라다녔다. 그런데 불도저 기사가 장비의 주인에게 작업 시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삥땅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요런 것 보고 배왔다가는 사람 베리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둬 버리고, 동네 친구의 소개로 간판집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한다.
“말이 취직이지 그 시절에는 불도저 운전이든, 간판 기술이든, 무슨 양복 재단이든…들어가서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서 기술자가 될 때까지는 월급 그런 것 없어요. 세끼 밥만 얻어먹으면 감지덕지예요. 그때 이성룡이라는 그 친구도 아직 기술을 배우는 조수여서 고무신 신고 뼁끼통 들고 다니면서 고생할 때였는데, 그나마도 저보다 먼저 시작한 그 친구가 부럽더라고요.”
당시 대천읍에는 간판 가게가 두 군데 있었다. 그중 하나가 이강연의 친구 이성룡이 조수로 일하던 간판집 ‘태양사’였고, 다른 한 곳이 바로 이강연이 들어가게 된 ‘뉴-선전사’였다.
뉴-선전사에서의 조수의 일과가 시작되었다. 주인은 간판 기술 배우러 들어간 이강연에게 붓을 쥐여준 게 아니라 리어카를 끌도록 시켰다. 간판을 떼러 가야 한다고 했다.
-주인아저씨, 우리가 간판을 멋지게 맹글어서 주문한 상점으로 갖고 가서 달아줘야 할 것인디, 어째서 리어카 끌고 간판을 띠러 가는 것이래유?
-요놈아, 헌 간판을 철거해 와야 고놈을 수리해서 새 놈으로 단장을 해서 달아줄 것 아녀.
당시에는 가게들이라야 워낙 형편이 영세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간판을 새로 만들어 달 엄두를 내지 못했다. 기존의 낡은 간판을 떼어다가 글자를 새로 써달라는 주문이 대부분이었다. 리어카에 작은 사다리를 싣고서 주문 들어온 가게에 도착해 보면, 간판 글자의 자음이나 모음이 여기저기 지워지거나 떨어져 버려서 그 흔적을 가늠하여 상호를 짐작해야 할 정도였다. 바탕에 칠한 페인트도 여기저기 벗겨져서 군데군데 회색 양철판이 드러나 있었다. 그나마 간판을 달고 있는 집은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쌀집이나 석유집, 혹은 연탄집 같은 가게들의 경우엔 주인이 판자때기에다 아무렇게나 써서 달아놓거나, 아니면 벽면이나 밀창 유리에다가 붉은 페인트로 대강 써놓고서 장사를 했다.
자, 이제 떼어온 헌 간판을 새것으로 단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주인은 리어카에서 간판을 내려놓자마자 쇠로 만든 주걱을 내밀면서 대뜸 “벗겨라!” 그랬다.
-예엣? 뭐, 뭣을 벳기라구유?
-쇠주걱 고놈으로 양철 바닥을 박박 긁어서 뼁끼를 다 벳겨내란 말이여.
옳은 말이었다. 그래야 다시 바탕을 칠하고, 바탕의 페인트가 말라야 글자를 쓸 터이니까.
-아이고, 카악, 퉤퉤!
별생각 없이 쇠주걱으로 박박 긁어대자 벗겨진 페인트 부스러기들이 얼굴에 머리에 마구 튀었고, 심지어는 벌리고 있던 입속으로도 들어갔다. 이강연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려, 시상에 쉬운 일이 워디 있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