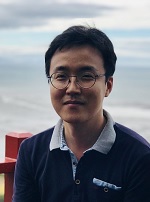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농업예산이 엉뚱한 한식진흥으로 새 나가고 있다. 물론 식품과 외식 역시 농식품부의 업무범위이고, 전통식품이나 외식산업 진흥에 농식품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식은 얘기가 다르다. 식재료보다는 기술·특성 등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분야며, 지금처럼 해외 지향적 사업에 집중할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뉴욕에서 비빔밥을 조리할 때 국산 쌀과 국산 채소, 국산 계란을 갖다 쓸 일은 없다. 소스류 등 일부 수요가 있다 해도 극히 미미하거나 수입농산물을 재수출하는 형태에 불과하다. 한식진흥과 우리 농민들의 연관성은 허상이다. 그럼에도, 심지어 한식진흥에 투입하는 예산은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용 예산인 ‘농안기금’이다.
기자는 한식진흥원 선재 이사장 취임 초기에 “진흥원의 사업이 농업과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이사장의 답변은 “한식 소비촉진을 통한 간접효과 정도를 생각해야 한다. 농업과의 연계는 aT의 업무다”였다. 자신들이 받아 운용하는 농안기금이 어떤 돈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식진흥원의 현실이다.
정부는 불합리하게도 한식진흥 업무를 농식품부에 배정했고, 농식품부는 불합리하게도 한식진흥에 농안기금을 편성했다. 어정쩡하게 한식진흥원으로 흘러들어온 농안기금은 법률에 명시된 사용목적조차 망각한 애매한 돈이 됐다. 그렇다고 문화·관광진흥 차원에서의 확실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좋은 먹잇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설립 직후엔 영부인이 한식진흥원을 손에 넣었고, 정권교체 후 심판이 이뤄지나 싶더니 다시 국정농단 세력의 마수가 뻗쳤다. 직원들의 ‘한 끼 180만원’ 호화 해외출장은 덤이다. 그렇게 아직까지 살아남은 한식진흥원이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다.
농업예산이 투입되는 이상 농식품부의 한식진흥 사업은 반드시 국내 농업을 중심에 두고 치열한 고민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끝내 그게 어렵다면 문체부가 이관받아 책임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여타 문화·관광진흥 사업과 같은 흐름 속에서 사업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지금의 한식진흥 사업은, 죽도 밥도 아닌 것에 쌀 팔아먹는 사람만 재미 보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