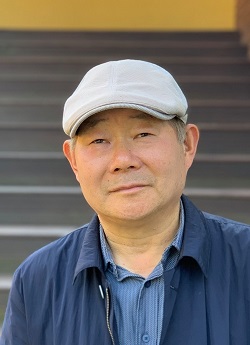
-으읏, 추, 추워….
-자, 자, 엄마가 한 겹 더 덮어줄 테니까, 이불 속으로 푸욱 들어와.
-그래도 자꾸 찬바람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석아, 방문 창호지를 찢어놓지 말았어야지. 사방에 구멍을 뚫어 놨으니….
-내가 안 그랬어. 형아가 찢었어. 숨바꼭질할 때 어디 숨었는지 내다본다고 손가락으로.
-안 되겠다. 엄마가 일어나서 수건으로 일단 바람구멍부터 막아놓고, 나중에 풀 쒀서 구멍 난 데 발라 때워야겠다. 아이고, 요놈의 부잡스런 사내 녀석들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으니.
자리에서 일어난 어머니가 수건 한 장을 갖고 가서는, 방문 여기저기에 뚫린 구멍을 얼기설기 막아놓고 돌아와 다시 자리에 눕는다. 아이가 이불 속에 파묻었던 얼굴을 내밀고는 힐끗 문 쪽을 바라본다. 수건 한 장의 네 귀퉁이를 끌어다 여기저기 뚫린 구멍을 막아놓는 바람에, 어스름 달빛에 드러난 그 수건의 형상이 뒤숭숭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때 쌩,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서 양철 세숫대야 뒤집히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그런데 엄마, 문에서 자꾸 귀신 소리가 들려. 잘 들어봐. 저 봐, 또 들리잖아.
-푸하하하, 귀신 소리가 아니고, 문풍지 떨리는 소리야.
1950~60년대 시골 초가집 마을의 겨울밤 풍경이 이랬다. 얇은 창호지 한 장으로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바람을 막아내자니 한기(寒氣)는 으슥으슥 머리맡으로 파고들고 문풍지도 밤새도록 온몸을 떨었다. 사내아이들이 올망졸망 많은 집은 방문을 보면 금세 표시가 났다. 아이들의 부잡스러운 장난질로 하루에도 몇 군데씩 구멍이 나고, 신문지며 비료 포대 종이로 그 구멍을 때워 붙이는 바람에, 방문은 덕지덕지 누더기 꼴이 돼 있었다. 하지만 설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 때가 아니면, 방문의 창호지를 갈아붙이기도 힘에 겨웠다.
요즘이야 제 아무런 오지 마을에 일부러 찾아간다 한들, 창호지 바른 방문을 달고 있는 집을 구경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주택의 창호(窓戶)를 설명하는 말들이 베란다, 유리, 알루미늄새시, 이중창, 커튼…따위로 바뀌어 버린 무려 21세기의 벽두(2002년)에도 바로 그 옛날의 창호지, 즉 한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간다.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에 사는 박해수씨(1943년생)는, 집안에 자그마한 한지 공장을 차려놓고 옛날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한지를 만든다.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만드는 이 종이가 예전엔 대부분 방문에 바르는 ‘문종이’의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겐 ‘창호지’라는 말이 귀에 익다. 그러니까 통칭하면 한지(韓紙)가 맞고, 창호지는 한지의 용도에 따른 한 갈래의 이름인 셈이다.
박해수씨의 가내(家內) 한지 공장에 도착했을 때, 대여섯 명의 동네 부녀자들이 제 가끔의 역할을 맡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처음 구경한 작업은 닥나무 껍질을 잿물로 처리하여 죽처럼 풀어놓은 ‘닥 섬유’를 대나무 발로 떠내서 차곡차곡 쌓는 공정이었다. 옛 시절 어촌 사람들이 갯바위에서 채취한 김(해태)을 잘게 다져서 물에 푼 다음에, 띠로 엮은 발로 떠내서 한 장 두 장 포개 쌓는 작업과 비유할 만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쌓아두었다 물기가 빠지면, 대나무 발에서 젖은 닥종이를 한 장씩 벗겨 드는데, 깔고 앉는 방석 석 장 정도 크기의 대형 파스를 연상시킨다. 그걸 두 손으로 들고 가서 증기로 달군 철판에 붙인다. 1인용 A형 텐트처럼 세워진 철판의 양쪽 면에다 젖은 닥종이를 붙여놓으면, 금세 물기가 증발한다. 마르자마자 지체 없이 떼 낸다. 닥종이 만드는 일차 작업이 그렇게 끝난다. 하지만 이는 닥종이 만드는 복잡한 과정 중에서 단편적인 공정일 뿐이다.
“옛날 한때는 우리 동네에 500호가 살았는데, 그중에서 400호가 닥종이 생산에 종사해서 먹고 살았어요. 내가 이래 봬도 한지 만드는 일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해수씨의 얘기다. 그랬으니 사연도 많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