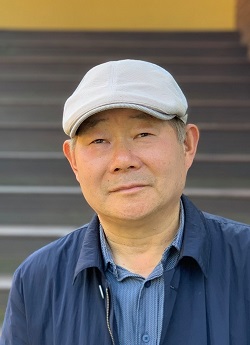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획기적인 품질의 연필이 등장했다. 수업 시작 전, 아이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어서 시끄럽다.
-얘들아, 이 연필 우리 큰 아빠가 사다 주신 건데, 냄새 한 번 맡아볼래?
-어디? 와, 되게 좋은 냄새 나는데? 그리고…무슨 연필이 이렇게 가벼워?
-그러니까 비싼 연필이지, 헤헤.
-연필 냄새가 어떻다고? 어디, 나도 나도 한 번 맡아보자.
향나무 연필이었다. 그 연필이 처음 나왔을 때, 향나무 연필 한 다스를 가진 아이는 뭇 아이들의 부러움을 독차지 했다. 나무의 질이 좋아서 부드럽게 깎일 뿐 아니라, 피나무 연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벼웠으며, 게다가 향긋한 냄새까지 풍겼으니…향나무 연필의 등장은 가히 연필 생산업계의 혁명이라 할 만 했다.
“그 동안엔 강원도 북부지방에서 나는 피나무를 재료로 써왔는데 연필의 품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자라는 향나무를 수입해 왔어요. 측백나무 과에 속하는 수종인데 가볍고, 매끄럽게 잘 깎이고, 거기에다 냄새가 향긋해요. 70년대 초부터 수입해서 재료로 썼는데 그때가 우리 연필공장의 전성기였지요.”
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는 흑연이나 점토의 정제기술도 향상되었고, 연필심을 굽는 소성로(燒成爐)를 독일에서 들여와 설치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가마에 장작불을 때면서 온도를 눈으로 대충 가늠했기 때문에 심이 고루 구워질 수가 없었는데, 독일산 소성로는 전력을 사용하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 향나무 연필이 선을 뵈면서부터 우리나라 연필 제조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던 것이다.
“그땐 상인들이 회사에 선금을 지불하고 여관에 기거하면서, 서로 먼저 받아가려고 아예 공장에 진을 치고 기다렸다니까요. 아, 그때가 바야흐로 우리 연필공장의 호시절이었지요.”
연필 제조회사의 주 고객인 학생들의 연필소비 문화에 또 하나의 변화를 몰고 온 것이 바로 연필 깎는 기계, 즉 연필깎이의 등장이다. 비록 손으로 돌리는 수동식이기는 하지만, 낑낑대면서 칼로 나무부분을 깎아내고, 다시 심을 뾰족하게 하느라 여기저기 문질러대고 하던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기계에 연필을 끼우고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아주 곱게 다듬어져 나왔으니, 학생들에겐 그 단출한 기계의 등장이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연필깎이의 등장으로 아연 긴장을 하게 된 쪽은 연필 제조회사였다.
“향나무 연필이 나오던 70년대 초에 연필깎이도 등장했어요. 그런데 깎는 주체가 사람의 손에서 기계로 바뀌다 보니, 제조 공정을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손으로 직접 깎던 시절에는 연필심이 정중앙에 박히지 않고 조금쯤 한 쪽으로 치우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심이 한 쪽으로 치우쳐 박혀있는 연필을 기계에 넣고 돌리면, 한가운데에 연필심 대신 나무가 뾰족하게 남게 되니 소비자의 항의를 받을 수밖에.
이제 전통적인 나무연필 제조회사였던 <문화연필>은 그 상호를 아예 <주식회사 문화>로 바꾸고 볼펜, 매직, 샤프펜슬, 수성펜 등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필기구 메이커로 변모했다. 필기구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더구나 수입자유화 조치로 중국과 동남아로부터 값싼 제품들이 무차별로 유입되는 바람에, 나무연필만으로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붓과 펜만을 사용하다가, 이 땅에 신식 교육이 도입되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필기구의 대표로 사랑받았던 나무연필…. 세상사는 사람들에게 제가끔 자랑할 만한 얼마씩의 지식이 있다면, 그 바탕에는 기꺼이 닳아서 몽당연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투박한 나무연필의 공이 숨어 있는 것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