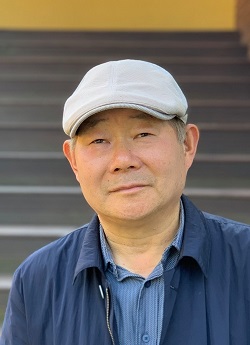
초창기에는 강원도에서 피나무 원목을 실어다가 전주의 연필공장에서 제재를 하여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 운송의 어려움도 있고, 나무를 켜는 과정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그래서 얼마 뒤에는 아예 강원도에서 연필 8자루를 만들 수 있는 크기로 1차 가공을 해서 가져다썼다. 산판에서 벌목한 재목을 인근의 제재소로 운반해서 거기서 가공을 한 다음, 한 다발씩 새끼줄로 묶어서 연필공장으로 운송해 오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여름철에 장마가 지거나 겨울철에 폭설이라도 내리면 인부들이 산판에 나가서 피나무 베는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재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빈발했다. 그 때마다 공장에 비상이 걸렸다.
-사장님, 지금 막 공장 기계 다 끄고 왔습니다.
-아니, 공장장, 벌써 자재가 다 떨어지고 없다는 얘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공장 직공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재가 떨어지고 없는데 붙잡아둬서 뭘 하겠어. 다들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연락하면 나오라고 해. 에이, 제재소 사람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강원도에 전화 걸어서 원목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벌목작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독촉 좀 하라구.
자재 조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서 일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보름씩이나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고, 길게는 한 달을 넘기기도 했다. 공장 가동이 그처럼 지지부진한데다 그나마 생산해 놓은 제품들마저 제대로 팔려나가지 못 하면, 직원들 월급이 제 때 나올 리 없었다.
-저…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당장 월급을 못 주겠으면 가불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좋아. 가불이야 당연히 해줘야지. 얼마나 가져갈 거야?
-천 자루만 주십시오.
“가불이라는 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연필을 주는 겁니다. 70년대만 해도 월급이 두세 달 밀리는 건 다반사였어요. 하지만 회사의 금고가 비었으니 어떡합니까? 돈 대신 창고에 쌓인 연필이라도 줘야지요. 직공들의 처지도 참 딱했지요. 당장 쌀이 떨어졌는데 연필을 가불로 받아가 봤자 고놈을 끓여먹겠어요, 삶아 먹겠어요. 갖고 나가서 수단껏 팔아야지요.”
기계가 멈추면, 직원들은 공장으로 출근하는 대신에 각자가 생계를 위한 외판원이 되어야 했다. 여기저기 구멍가게를 찾아다니며 평소의 공장도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주겠노라고 제의를 해보지만, 그래봤자 몇 다스뿐,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받아주는 가게는 없었다.
-우리, 여기 전주에서만 뱅뱅 돌 게 아니라 외지로 한 번 나가보더라고, 나는 버스 타고 남원으로 가봐야겠네. 정 안 팔리면 광한루원 월매네 주막에 가서 술이라도 바꿔 마시지 뭐.
-나는 이참에 연필 봇짐 챙겨 메고 멀찌감치 충청도로 가봐야겠어.
더러는 멀리 시골 국민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장의 협조를 받아 전교생을 상대로 연필 선전을 할 기회를 얻기도 했으나, 전문적인 판매 상인이 아닌지라 장사 수완이 따라주지 못 했다.
이 학교 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팔아봤자 공장에서 챙겨가지고 나온 천여 자루를 소화하기엔 어림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아무 마을이나 찾아 들어가서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
-할머니, 전주에 있는 문화연필 공장에서 연필 선전을 좀 하러 나왔습니다.
-글씨 쓰는 연필 말여? 나는 못 배와서 가이갸 자도 몰러. 원, 벨놈의 장수들을 다 봤어도 집집이 댕김서 연필 사라는 사람은 또 첨 보겄네. 날 더운디 시원한 미숫가루 타줄 것잉께, 평상에 앉아서 고놈이나 한 그릇 묵고 가.
-예, 고맙습니다. 연필 몇 자루 드릴 테니까, 손주들 오면 주세요.
그렇게들 살았다. 그 시절 연필공장 직공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