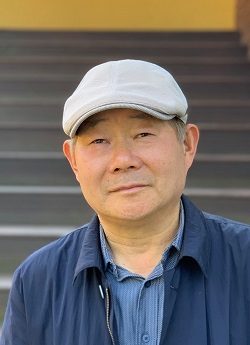
흑연과 점토를 재료로 삼아서 연필에 들어갈 심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그 심을, 가공해 놓은 나무에다 결합할 차례다. 요즘이야 성능 좋은 접착제가 다양하게 생산되지만 1950~60년대만 해도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다. 여공들이 작업대에 죽 늘어앉아서 8개의 홈이 파인 나무판자 두 개에다 밀가루 풀을 각각 바르고서, 그 홈에다 심을 넣는다. 그런 다음 풀칠이 된 두 개의 나무판자를 맞붙여서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였다. 그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건조실로 옮기지요. 거기서 또 24시간 불을 때서 건조시킵니다. 하루가 지난 뒤에 꺼내 가지고 톱날 장치에다 대고 죽 밀면, 드디어 여덟 가닥으로 나누어져요. 그런 다음에 도장반(塗裝班)으로 넘어가서 빨강 파랑 노랑 등의 페인트를 칠하지요.”
색칠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또 다시 건조과정을 거친다. 건조된 연필을 이제 길이에 맞게 자르는 일이 남았다. 우리나라 연필의 표준 산업규격은 172밀리미터이므로 그 길이에 맞게 기계로 자른다. 이렇게 잘라낸 연필을 ‘양절(兩切) 연필’이라 한다. 길이에 맞춰 양쪽을 절단해 놓은 상태의 연필이라는 의미다.
이제 불량품을 가려내면 연필 만드는 모든 공정이 끝난다. 대개의 불량품은, 한가운데에 있어야 할 연필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불량품은 폐기 처리한다.
혹시 연필을 훔쳐가는 직공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은 하지도 않았는데, 공장장 도옥환 씨는 자진해서 이런 말을 툭 꺼낸다.
“왜 옛날 성냥공장 직공들이 퇴근할 때 몰래 성냥을 통째로 훔쳐가다 들켜서 혼났다더라,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요? 그런데 우리 <문화연필> 공장에서는 연필을 슬쩍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고요? 직원 한 명당 한 달에 두 다스씩 연필을 무상으로 나눠줬거든요. 갖다가 동생들이나 친척들 주라고.”
1960년대에 국민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한 때 이런 수수께끼가 유행했다.
-머리가 잘못한 것을 꽁무니가 고쳐주는 게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
-고무 달린 연필.
언제부턴가 꽁무니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보급되었다. 물론 <문화연필>에서도 지우개를 부착한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학교 선생님은 그것을 무슨 세기적인 발명품이라도 되는 양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요놈들아, 새 시대에는 머리를 써서 살아야 하는 거야. 글씨를 쓰다가 틀리면 쓰던 연필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필통에서 고무를 꺼내서 지우고…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그런데 꽁무니에다 지우개를 요렇게 딱 붙여놓으면….
그 지우개 달린 연필은 잘난 척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느니 ‘발상의 전환’이니 따위의 훈계를 할 때 단골로 끌어다 붙이는 비유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시중에 나온 연필에서 꽁무니의 지우개가 일제히 사라져버렸다.
“아이들이 걸핏하면 지우개를 입으로 잘근잘근 깨물거든요. 그런데 그 지우개에 유해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공부 직원이 우리 공장에 시찰을 나와서는, 앞으로 연필에 지우개 붙이지 말라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자제들이 어린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딸의 건강에 해가 된다고 해서….”
지우개가 없어진 대신에 연필의 끝부분을 예쁘게 물감 칠을 해서 마무리했는데, 연필공장 사람들은 그 작업을 아름다울 미(美)자와 머리 두(頭)자를 써서 ‘미두작업’이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