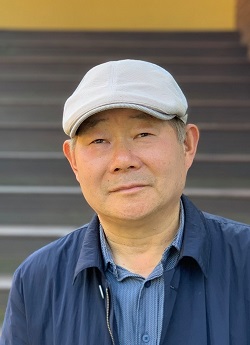
근대식 연필은 18세기에 프랑스의 ‘콩테’라는 사람이, 흑연과 진흙을 짓이겨서 만든 연필심을 고온에서 굽는 방식으로, 처음 실용화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연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세기 후반이며, 국산 연필공장들이 문을 열었던 때는 1940년대 중후반이었다.
연필 제조업체들의 연혁을 살펴보니, 해방직후인 1946년 10월에 ‘동아연필(주)’이 설립되었고, 1949년 5월에는 ‘문화연필(주)’이 창립된 것으로 나온다.
2002년 8월에 내가 찾아간 곳은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문화연필 공장이었다,
공장에 들어서자 저만치에서, 완제품인 연필을 가지런히 쌓아놓고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끌리듯 그 쪽으로 다가갔다. 나도 동가리 연필 하나를 애지중지하던 시절을 살았던지라, 수북이 쌓인 연필더미의 모습이 꿈결만 같다. 마치 꼬깃꼬깃한 지전 몇 닢을 만지작거리며 하루살이를 걱정하던 가난뱅이가, 갑자기 조폐공사 창고의 돈더미 앞에 선 느낌이랄까.
여남은 명의 여공들이 작업대에 둘러앉아 연필더미에서 각기 열두 자루씩을 헐어 한 다스짜리 종이 케이스에 넣는 작업이었는데, 나무연필들이 어지러이 부딪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필 무더기에서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열두 자루를 척척 집어내는 여직공들의 신기에 가까운 손놀림이다.
“에이, 첨부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한 동안은 다들 헤매지요. 에누리 없이 열두 자루를 척척 덜어서 집는 것을 우리끼리는 ‘연필 잡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익숙하게 잡아내는 데에는 넉 달쯤이 걸려요. 많을 때에는 이 공장에 30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복작거리면서 작업을 했는데… 연필 만드는 공정이 자동화로 바뀌고 나서는 20여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노동자의 얘기다. 물론 다 만들어진 연필을 종이 케이스에 집어넣는 작업은 연필 제조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공정에 해당한다.
1950~60년대 당시의 연필 생산에 얽힌 얘기를 들려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했기로, 일찍이 퇴직했던 백발성성한 ‘올드 보이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1950년대 초에 그 연필공장에 입사했던 하태균 씨(1934년생)와 그보다 조금 뒤에 입사한 정천우‧이종하 씨, 그리고 현재(2002년) 문화연필(주)의 공장장인 도옥환 씨, 생산관리부서 차장인 육병현 씨 등을 증언자로 확보했으니…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이야기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선 배부르다.
1960년대 초, 강원도 화천의 한 야산.
-자, 다들 저리 비켜! 나무 넘어간다!
벌목꾼들의 톱질에 아름드리나무가 쓰러진다. 연필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베어지는 이 나무가 바로 재질이 단단하고 결이 좋기로 이름난 피나무다. 화천이나 인제 지방에서 베어진 이 피나무들은 화물열차에 실려서 전주역에 도착하고, 그 곳에서 다시 트럭에 실려서 연필공장으로 운송되었다.
“초창기에는 연필공장 내부에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 시설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나무 원목을 대강 토막 낸 다음에 다시 그 나무토막을 잘게, 더 잘게 자꾸 켜고 자르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가는 거지요.”
“그때만 해도 공장에 전기 톱날이 하나만 설치돼 있었던 데다가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제재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인부들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했어요. 취재 오신 작가 선생이 코흘리개 시절에 깎아 썼던 그 연필,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