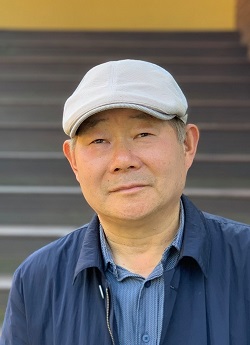
목포항에서 여객을 태운 가야호가 뱃고동 소리를 두어 번 길게 울리고는 드디어 부두와 멀어진다. 하지만 조타실 지붕에 설치된 확성기로 ‘사아공의 배엣노래…’를 가물거리며 출항한 가야호가 제주도를 향해 직항한 것은 아니었다. 가야호의 항로는 먼저 진도의 ‘벽파’라는 곳에 한 번 접안을 하고, 다시 추자도에 기항을 한 뒤에 뱃머리를 제주항으로 향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목포에서 추자도까지 다니던 단골손님 중에는 유명인사가 있었다. 박치기 왕으로 이름난 프로레슬러 김일이었다. 박준영 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김일 선수가 낚시를 아주 좋아했어요. 추자도에다 어선 한 척을 마련해 두고 단골로 왕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일 선수가 승선하면 비상이 걸려요. 몸집이 워낙 커서 일반 침대칸의 침대는 좁아서 몸을 눕히지 못 하니까, 선원들이 모여 자는 침대로 특별히 모셔야 했거든요.”
목포를 떠나 여덟 시간여 만에 제주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곳에서도 태풍주의보를 만나면 목포에서처럼 발이 묶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더러는 태풍주의보로 인한 출항금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선원들이 미리 알고 조치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선원들이 한창 출항준비를 하고 있는데 베테랑 선원인 갑판장이 나서서는 곧 태풍주의보가 발령될 것이니 출항준비를 멈추라고 말한다.
-아니, 갑판장님, 항만청에서도 아직 아무 연락이 없고 라디오 일기예보에도 태풍 온다는 소리는 없었는데….
-꼭 방송에 나오고 항만청에서 연락이 와야 알겠어? 저기 봐. 바다에 떠있던 갈매기들이 전부 다 육지 쪽 산봉우리로 날아올라가잖아. 영락없이 태풍이 올 징조야.
“김 아무개라는 나이 많은 갑판장이 있었는데 그 양반은 갈매기가 나는 모양만 보고도 태풍이 온다는 걸 단박에 알아맞혔어요. 실제로 한두 시간 뒤에는 주의보가 발령되더라니까요.”
여객선을 운항하다 보면 도중에 종종 비상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박준영 씨에 따르면, 목포에서 제주도를 향해 갈 때보다 제주에서 여행을 마친 여객들을 태우고 목포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했다.
-선장님, 지금 승객 중에 산통을 호소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안내방송 좀 해주세요.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뱃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배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배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 재수가 좋다는 속설 때문이다.
-승객 여러분께 긴급히 알립니다. 지금 우리 배에 타신 아주머니께서 산통이 심합니다. 여러분 중에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원, 아니 아기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도 계시면 지금 즉시 3등 객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초에 가야호에서 아들 한 명이 탄생했는데, 선장이 이름을 ‘가야’라고 지어주고, 쌀 한 가마에다 미역 한 손, 그리고 평생 동안 제주도를 무료로 왕복할 수 있는 증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었지요.”
아이를 낳는 경우야 더 없이 경사스런 일이지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 된다. 요즘이야 비상연락을 취하면 해경의 경비정이나 응급헬기가 출동하지만 당시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드물게는 승객이 배 안에서 숨을 거두기도 했다. 그런 경우 선원들은 화물칸 앞쪽에다 시신을 안치하고, 간이 빈소를 차려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1980년, 드디어 가야호가 퇴장하고 일본으로부터 3,000톤급 카페리호가 목포-제주 항로에 투입되었다. 500톤 급의 가야호에 비하면 여섯 배나 큰 규모였다. 드디어 자동차와 함께 제주여행을 할 수 있는 ‘카페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