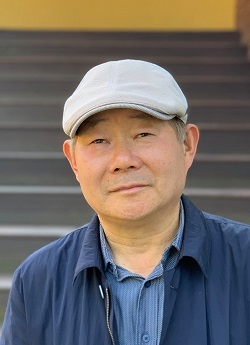
토요일 오후, 서울 방화동의 한 가정집이 시끌벅적하다. 고희를 넘긴 그 집 가장의 생일 축하모임 때문이다.
-아니, 박 서방 아직 도착 안 했어? 출발했다고 연락 온지가 한 시간 반이 넘었는데?
-오늘 주말이라 길이 좀 많이 막히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그렇지 거기도 서울인데 이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형님도 참, 말이 같은 서울이지 거기는 북쪽 끝에 있는 노원구 상계동이고, 여기는 서쪽 끝에 있는 강서구 방화동 아닙니까.
그때 마침 대문이 열린다. 그런데 현관을 들어선 사람은 상계동의 그 박 서방이 아니다.
-어어? 제주도 둘째형님이 먼저 오셨네요. 햐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다고 전화하기 직전에, 상계동 박 서방한테서도 출발한다는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멀리 바다건너에서 출발하신 분이 더 일찍….
김포공항 인근에서 모임을 갖다 보면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한다. 제주도에서 여객기를 타고 날아오는 사람이야 한 시간이면 어김없이 도착하지만, 같은 서울에서도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경우, 교통 사정에 따라서는 두 시간 가까이나 걸리기도 한다.
아침마다 김포공항에는, 마치 출근버스를 기다리는 버스정류장의 승객들처럼,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아침에 항공편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저녁이면 서울로 돌아온다. 친척을 방문하기도 하고, 골프를 즐기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에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시간강사들도 있다. 제주도는 더 이상 반역 죄인을 위리안치 시키던 절해고도가 아니라, 마실 가듯 다녀올 수 있는 이웃 마을이 된지 오래다. 물론 인천이나 부산이나 목포 등지에서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승용차를 배에 싣고 가서 제주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항공여행이 일반화하지 못했던 1960~70년대만 해도, 육지 사람이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쉽게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2002년 3월 중순, 목포항 여객터미널.
-여보세요. 아, 제주도 가실라고라우? 아이고, 요새는 겁나게 빨라졌지라우. 다섯 시간 반 밖에는 안 걸린당께요. 물론 자가용 승용차도 실고 갈 수 있지라우. 혹시 일등 객실 침대칸을 이용하실라믄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이. 그라고….
걸쭉한 사투리로 문의전화에 응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씨월드고속페리’라는 회사의 박준영 차장이다. 60년대부터 목포-제주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한편 제주도로 보낼 화물을 잔뜩 실은 트럭 한 대가 부두로 들어온다.
-스톱! 요거이 오늘 오후에 제주도로 갈 화물이라 이 말이지라우? 일단 쩌그 컨테이너들 있는 디다 하역을 한 다음에 선적을 해야 됭께, 차를 저 짝으로 쭉 빼시요이.
화물 선적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이 사람은 목포항의 부두 노동자로 반생을 지내왔고, 내가 취재하러 갔을 당시에는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 해안연락소 소장을 맡고 있던 김삼수 씨다.
박준영‧김삼수 이 두 사람이, 1960년대 이래 목포-제주 연락선 운항에 얽힌 갖가지 사연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줄 것이다. 그 시절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배를 타고 무슨 용무로 바다를 건너 제주에 갔었는지, 목포에서 제주로 혹은 제주에서 목포로 실어가고 싣고 나왔던 화물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태풍주의보가 내려서 여러 날 동안 제주에 발이 묶인 육지 사람들과 목포에 발이 묶인 제주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궁금한 것이 어디 그것들뿐이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