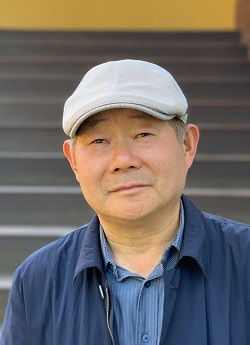
일반적으로 ‘서리’는 사내아이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참외든 복숭아든 남의 것을 훔쳐 먹으려면 밤 시간에 끼리끼리 모여서 작당을 해야 하는데, 당시만 해도 부모들은 딸이 밤 마실 가는 것을 여간해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로당에 모인 농촌 출신의 할머니들이 소싯적을 회상할 때면, 어김없이 서리에 관한 추억을 빼놓지 않는다. 그들도 서리를 했다. 대신에 소녀들의 서리는 매우 소박했다.
초여름 어느 날 빨래터에서 돌아오던 너덧 명의 소녀들이 뉘 집 밭 들머리의 풀밭에 앉았다.
-뻐꾸기도 배고프다고 울어쌓고…우리 저 아래 춘식이네 목화밭에 다래 서리하러 갈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춘식이 엄니 좀 전에 바구니 들고 목화밭에 들어간 것 못 봤어? 다래 서리하다 잡히면…너 꼼짝없이 춘식이한테 시집가야 돼.
-하하하….
-그럼 아쉬운 대로 여기 금철이네 밭에 들어가서 옥수수나 서리해오자.
소녀들은 의기투합해서 살금살금 옥수수 밭고랑으로 들어간다. 때가 초여름이라 했으니 옥수수 열매가 벌써 익었을 리는 없다. 소녀들이 훔치러 들어간 건 열매가 아니라 옥수숫대다.
“봄에 파종하는 옥수수나 수수는 가을철이 되어야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열매가 영글지 않은 초여름에 수숫대나 옥수숫대를 낫으로 토막 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입으로 베어 물면 제법 단맛이 나요. 군것질거리가 귀한 시절이라 그렇게 당분 섭취를 한 것이지요. 가끔은 쥔한테 들켜서 지청구를 듣기도 했지만 크게 혼나지는 않았어요.”
심영춘 할머니의 얘기다. 비슷한 시기에 서리를 했던 밭작물 중에 목화다래가 있었다. 목화나무는 봄철에 꽃이 피었다가 진 자리에 푸른색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곧 목화다래다. 부드러운 육질에 달콤하기까지 해서 수숫대 씹는 맛 따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물론 다래를 따먹어버리면 그 열매 하나만큼의 솜을 수확할 수 없다. 그래서 다래가 여물어가는 시기가 되면 주인장이 밭두렁을 어슬렁거리며 혹 서리하러 오는 아이들이 없나 망을 보기도 했다.
밭작물 서리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콩 서리였다. 남의 콩밭에 들어가서 조금 덜 익은 풋콩을 뽑아다 줄기째로 불에 구운 다음, 깍지 속의 콩을 까먹는 맛이 그만이었다. 아예 콩깍지째 입속에 넣었다가 이로 자근자근 훑어 내리면 고소한 콩알이 일렬종대로 입속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밀이나 콩을 불에 끄슬려 먹는다고 해서 그걸 모두 밀 서리나 콩 서리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가령 식구들 모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한다.
-엄니, 콩이 제법 여물었던데, 우리 콩 사리 해먹으면 안 돼?
-그래 까짓것, 몇 그루 뽑아오너라. 출출한데 모처럼 우리 식구 콩 사리나 해먹자.
이런 경우에는 ‘서리’가 아니고 ‘사리’다. 설익은 콩이나 밀을 불에 끄슬려 먹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 말은 ‘사리’인데, 똑같이 사리를 하더라도 남의 것을 훔쳐다 먹을 때에는 비로소 ‘서리’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어느 지방 할 것 없이 널리 쓰이던 그 ‘사리’라는 말은 유감스럽게도 국어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다.
밀 서리나 콩 서리, 그리고 (옥)수숫대 서리는 여자 아이들도 심심찮게 했을 정도로 서리 중에서는 가벼운 축에 들었다. 그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단계의 서리가 바로 겨울철에 하는 ‘무 서리’였다.
“여름이나 가을에 들길 지나다가 남의 남새밭에서 무를 하나 뽑아서 껍질을 벗겨 깨물어 먹으면 매콤하면서도 달달하지요. 하지만 그거야 뭐 서리랄 것도 없지요. 진짜 무 서리는요, 겨울철에 남의 집안에 있는 무를 훔쳐다 먹는 거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