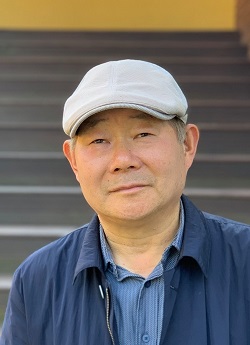
장면 #1. 국민학교 하굣길.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요즘은 학교에서 왜 우유가루 배급도 안 주지?
-우리 저 쪽 산길로 해서 집에 갈까? 산딸기 익었을지 모르는데.
-딸기 그거 몇 개 따먹는다고 배가 부르냐. 얼른 집에 가서 삶은 고구마나 먹는 게 낫지.
-얘들아, 저 쪽 영길이네 밭에서 밀 서리 해다가 구워 먹을까?
-밀? 아직 다 안 익었을 텐데….
-바보야, 지금이 딱 좋아. 너무 익어버리면 맛이 없잖아.
-좋아! 난 불 피울 테니까, 너희 둘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 모가지 잘라가지고 와.
-알았어. 누구 오나 망 잘 봐야 돼. 영길이 아버지한테 들키면 학교로 쫓아온단 말이야.
-걱정 마. 사람 나타나면 내가 ‘떴다 떴다 비행기’ 그 노래 큰 소리로 부를 테니까.
“설익은 밀 이삭을 한 움큼씩 잘라가지고 나와서 모닥불 위에 데치듯이 쓱쓱 그슬린 다음에 두 손바닥으로 싹싹 비벼서 입으로 후후, 불면 퍼런 알맹이만 남아요. 고놈을 한 볼때기씩 털어 넣고 씹으면…아, 그 고소한 맛을 어떻게 잊겠어요.” (이청길. 1953년생)
장면 #2. 참외밭 들머리. 아침.
-아, 광주리 갖고 빨리빨리 오지 않고 뭣하고 있어요. 내일이 장날인데 서둘러 따야 아침에 일찍 갖고 나가 팔지!
-여보! 이쪽으로 좀 와 봐요! 간밤에 또 애들 손 탔네. 참외밭이 엉망이 됐다구요!
-이게 뭐야! 어떤 놈들이 또 서리를 해갔단 말이야?
-당신은 어젯밤에 원두막 안 지키고 뭘 했어요. 아이고, 익지도 않은 참외를 따서 다 팽개쳐놓고, 참외 넝쿨도 다 뽑아 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쯧쯧쯧, 이런 못된 놈의 자식들!
“사내 녀석들이 대개 달밤에 참외서리를 나와요. 달이 떴다고는 하지만 또렷하게는 안 보이니까 닥치는 대로 마구 땄다가 안 익은 놈은 팽개쳐버리고…아침에 나가보면 엉망이 돼 있어요. 익은 놈만 골라서 몇 개 따다 먹으면 좀 좋아.” (1937년생. 과수원집 딸 심영춘)
장면 #3. 시골 집 외양간. 밤.
-야, 야, 여기가 닭장 맞아? 외양간이잖아? 설마 소를 잡아먹자는 얘기는 아니지?
-쉿, 이 집은 닭장이 따로 없고, 저쪽 외양간 천장 횃대 위에 닭이 올라 앉아 있을 거야.
-맞네, 저기 일렬로 죽 앉아 있다. 야, 이쪽 이놈은 아주 큰놈이야. 수탉!
-무턱대고 움켜잡으면 안 돼. 살며시 날개 밑으로 손을 넣어서 모래주머니를 살살 쓰다듬어 주다가 살짝 안고 나오면 닭이 소리를 안 지를 거야. 어, 그런데 이거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 덜컥, 안방 문이 열리는 거요. 그래서 수탉 고놈을 덥석 안고서 냅다 튀었지요.” (이명기. 1960년생)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단히 친근한 느낌으로 우리 생활주변에 함께 하다가 시나브로 자취를 감춰버린 말들 중에 ‘서리’라는 말이 있었다. 국어사전에서는 ‘떼를 지어서 주인 몰래 훔쳐 먹는 장난’으로 풀이한다. 그 시절을 살았던 농촌 출신 남자들 치고 서리를 해보지 않고 청소년기를 건너 뛴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이젠 여럿이 몰려가서 주인 몰래 뭔가를 훔쳐 먹는 행위가 ‘장난’으로 용인되는 세상은 이미 아니다. 떼도둑, 혹은 집단절도행각… 등의 수갑소리 나는 어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하고 싶어진다. 옛 사랑 같은 그 ‘서리’ 얘기를. 밝은 옷 뒤집어 입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