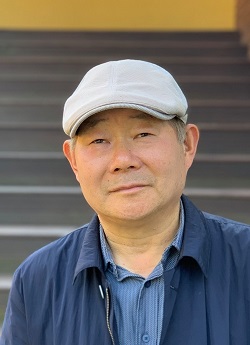
강화군 석모도의 남쪽 끝에 있는 어유정(魚遊井) 포구에서, 소금가마니를 챙겨 실은 돛단배 한 척이 닻을 올렸다. 마을 주민 네 명이 황해도 연백으로 소금 팔러 간다. 돛단배라 해서 언제든 돛만 올리면 수면 위를 사르르 미끄러져 달려 나갈 것 같지만 천만에, 적당한 세기의 순풍을 만나야 하고, 무엇보다 배가 전진하는 방향과 풍향이 맞아떨어졌을 때의 얘기다.
-바람이 통 없으니 돛은 내리고 일단 노를 저어야겠어. 이번 장삿길도 고생깨나 하겠구먼.
강화에서 빤히 건너다보이는 곳이 연백 땅이지만, 조그만 목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면 바람을 잘 만나도 한 나절은 족히 걸렸다. 바람이 없는 날이면 뱃길이 배나 힘들었으나, 노 하나에 둘씩 달라붙어 영차 어영차, 장단 맞춰 젓다보면 아무렴 염전 노동만큼이야 했겠는가.
-이번엔 연안 장터로 가보는 게 어때?
-연안읍장은 2‧7장인데 날짜가 맞아야 말이지. 지난달에 온정면 봉화리 쪽으로 가서 사흘 만에 다 팔고 왔잖은가. 이번에도 그 동네로 가볼까?
-아이고, 이 사람아, 스무날 만에 소금 팔아먹었던 동네에 또 나타나서 소금가마니 부려놓으면, 사돈네 집이라도 안 사주겠네. 이번엔 저 쪽 호동면 나진포 쪽으로 가보더라고.
한 나절을 넘겨 나진포에 배를 댔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각자 소금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동네를 돌며 행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해방 직전에 황해도 연백에는 전국에서 제일 큰 천일염전이 있었거든요. 전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에 건너가서 소금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가령 외지인이 탄광촌에 가서 연탄 행상 하는 격이라고나 할까, 허허허….”
어유정 마을 토박이인 노상우 노인이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짓는다.
실제로 그러했다. 1939년 11월 1일치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일제가 황해도 연백에 조선제일의 염전조성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4년 후인 1943년에는 드디어 1,250정보(175만평)의 천일염전이 완공된다. 그렇다면 소금의 주산지인 연백에 가서 어유정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소금을 팔 수 있었을까? 소금가마니를 짊어진 행상을 따라가 보자.
-자, 소금이 왔어요. 석모도 어유정 소금입니다!
-어유정 소금이 틀림없어요?
-그럼요. 이것 보세요. 새색시 버섯목보다 하얀 이런 소금, 구경이나 해봤어요?
-아이고 참 곱기도 하다. 듣던 대로 어유정 소금은 다르네. 좁쌀도 받아요?
-아무렴요. 좁쌀도 받고 보리쌀도 받고 콩도 받고 팥도 받습니다. 뭐든 많이만 가져 오세요.
말하자면 석모도의 어유정 소금은 연백염전의 소금과 비할 바가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천일염전의 소금은 아무것도 깔지 않은 갯벌 밭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담았기 때문에, 빛깔도 거무튀튀했을 뿐더러 벌흙 덩어리가 마구 섞여 있기도 했어요. 거기 비하면 가마솥에서 구워낸 어유정 소금은 색깔부터가 백옥 같아서 그야말로 최고 상품(上品)이었거든요.”
소금을 팔러갔던 석모도의 어민들은, 가져갔던 소금의 양만큼 곡식을 배에 싣고 돌아왔다.
해방이 되고 국토의 허리가 잘렸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천일염전이 자리했던 황해도 연백군의 남쪽 땅은 38선 이남이었다. 그러다 전쟁이 터졌다. 연백군에 살던 피란민들이 강화나 김포 등지로 대거 내려왔다. 연백염전에서 일하던 염부들 중 상당수가 석모도 어유정 마을로 흘러들어왔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먹고 살기가 궁해진 피란민들이 특공작전을 꾸몄다.
-우리 오늘 밤에 연백염전 창고로 소금 털러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