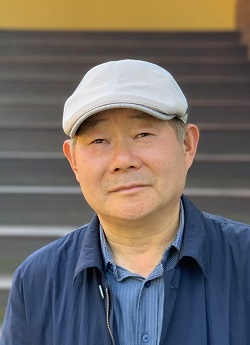
석모도 해안에 천일염전이 조성되기 이전엔, 어유정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가마솥에다 바닷물을 붓고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하지만 바닷물을 맹물 그대로 길어다 끓이는 것이 아니었다. 갯벌 밭에 조성한 염판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열흘 넘게 증발시킨 다음, 그 간수를 길어다 끓이는 것이었다. 어유정 마을 토박이인 노유정 할아버지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재래식 제염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어이, 박 씨, 오늘 우리 염판 만드는 날인데 혹시 깜박 잊어버린 것 아녀?
-그럴 리가 있나. 금세 소 끌고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있게.
-며칠 안 있으면 사리 때가 닥칠 텐데, 자기네 염판 다 만들었다고 세월아 네월아 하기야?
-아이고 이 사람, 주먹 소금 삼키고 냉수 찾는 놈처럼 왜 이렇게 닦달을 해대나. 가자, 이랴!
같은 마을에 사는 두 남자가 각기 소 한 마리씩을 몰고 나와서는 염판작업을 위해 바닷가로 내려간다. 염판작업이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간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터 닦기 작업이다.
두 마리의 소가 동시에 끄는 써레로 일정한 넓이의 갯벌 밭을 파헤치고, 가장자리에 빙 둘러 둑을 만든다. 바닷물을 가두어 말릴 염판 조성 공사를 하는 것이다.
“바닷물은 보름 간격으로 사리와 조금이 교차되는데, 조금 때는 갯벌 위쪽에 만들어놓은 염판까지는 물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리 때에 올라오는 바닷물을 염판에 가뒀다가 조금 때에 증발시키는 거예요. 염판 한 쪽에다가는 우물 모양의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시루처럼 거르는 장치를 해놓았어요. 한 열흘 가까이 지나면 염판의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봐요.”
-어때? 간이 들었어?
-이만하면 됐네. 자, 거기 고무래 갖고 와. 간수 구덩이로 밀어넣자구.
-모레쯤에는 사리 때가 닥쳐서 바닷물이 염판까지 차올라 올 것이여. 애써 간수 만들어놨다가 바다로 흘려보내버릴 수는 없는 일이지. 서두르자구.
열흘 동안 햇볕에 증발시켜 짭짤해진 바닷물을 구덩이에다 고무래로 밀어 넣으면, 갯벌 찌꺼기는 시루에 걸러지고 간수만 구덩이에 고이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구덩이에 고인 간수를 나무 물통에 담아서 대형 가마솥이 있는 쪽으로 운반을 해야 한다.
“나무로 만든 물통에다 간수를 퍼 담은 다음에, 물지게 양쪽에 한 통씩 매달고 가마솥이 있는 곳까지 운반을 하는데, 그 작업이 중노동이에요. 어깨가 다 벗겨지고,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놈의 간수 운반하다가 몸뚱어리 간수까지 다 빠져나가겠다고….”
소금 굽는 가마가 설치된 움막을 ‘염벗’이라 했다. 염벗에 설치된 가마솥은 크기가 넓은 방 만큼이나 했다. 이제 장작을 가져다 불을 때야 한다. 마치 엿을 고듯이 밤새도록 불을 때면 아침녘에 희고 고운 소금이 결정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구워낼 수 있는 소금은 기껏해야 서너 가마니에 불과했다. 게다가 염판을 닦고, 간수를 만들고, 그 간수를 운반하여 가마솥에 굽고 하는 작업 자체가 워낙 힘든 노역이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주로 생계가 곤란한 빈민들이 부업 삼아서 그 일을 했다.
이제는 달고 맛난 최고급 어유정 소금을 내다 팔 일이 남았다. 소금 가마니를 선착장으로 운반하여 배에 싣는다.
-자, 닻 올리고 돛 달아라. 이번엔 연안읍장으로 가자!
석모도 어유정 사람들이 주로 소금 장삿길에 나섰던 곳은 황해도 연백지방이었다. 물론 분단 이전의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