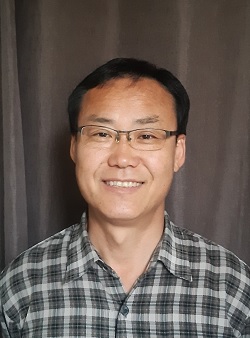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신청과 농가수당 신청을 알리는 마을 방송을 하고 마을회관을 나섰다. 회관 앞에는 주민 서너 명이 나와 있다. 독감 신청을 하기 위해 나온 모양이다. 다들 한마디씩 거들더니 종국엔 나락에 목도열병이 심하게 번져 올 농사도 망쳤다는 푸념과 함께, 이제라도 방제를 하네 마네 갑론을박한다.
흉년은 흉년대로 걱정이고, 쌀금 떨어질까 봐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라는 농민의 처지는 실로 애달프다. 마치 소금장수와 우산장수를 자식으로 둔 부모의 심정이랄까. 그래도 곧 논 물꼬를 터서 수확기를 맞이하는 일만 남겨놓은 농사꾼으로선 분주하던 봄날과 뜨겁던 여름을 지나 오랜만에 느긋함을 맛보는 시기다. 초가을 들녘 또한 태풍의 생채기만 없다면 여느 때보다 넉넉하고 풍성한 계절이다.
그러나 최근 3~4년간 날씨를 보면, 안타깝게도 앞으로 풍년가를 부를 일은 요원해 보인다.
2018년엔 한여름 고온 현상으로 벼 이삭에 수정이 잘 되지 않아 흉년이 들었고, 작년에는 기록에 남을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많은 논밭이 물에 잠겼다. 올해는 혹시나 했더니만 뒤늦은 가을장마로 병해충이 극심해 이미 평년작도 물 건너갔다. 기후위기는 가까운 미래의 일이거나 어쩌다 닥치는 이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과 대면하고 있는 일상이 돼버린 듯하다.
가을들녘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연이은 흉년에 쌀값마저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쌀 수급 안정이란 명목으로 공공비축미 37만톤을 시장에 풀었다. 다른 품목 역시 생산비라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농산물 가격이 오를라치면-보다 적확한 표현으로 ‘회복될라치면’-긴급수입물량을 마구 시장에 쏟아내는 역대 정부들의 작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시 소비자를 위한 희생이란 표현도 이젠 너무 점잖아 진부하다. 이쯤 되면 농민을 아예 등급도 없는 등외(等外)국민이라 칭하는 게 옳다.
전체 인구의 4%대로 전락한 농민은 정치가 작동되는 영역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왔던 ‘농민의 자식’이라는 역겨운 언사조차도 이젠 나오지 않는다. 정치적 유배자이자 변방의 소수자인 농민에게 다수 국민들은 ‘지방’에 사는 ‘촌놈’이라 부르고, 무지하고 몽매하다며 무시한다. 도시 사람 흉내라도 낼라치면 ‘촌사람들이 더 약아빠졌다’며 손사래를 친다. 도시 서민들조차 농민에게만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혜택을 준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농민들의 신세가 그야말로 밑바닥이다.
“목도열병으로 올해도 작년마냥 반타작하는 거 아녀? 아, 근디 작년 물난리 난 거 보상금은 언제 나온댜?” “농사짓는 사람들 받는다는 수당, 언제부텀 신청헌다고? 뭐시냐 국가서 또 재난지원금인가 뭔가도 나온담선? 이러다 나랏돈 바닥나는 거 아닌지 모르겄네잉.”
병충해 피해 때문에 잔뜩 심각한 얼굴들을 하다가 이것저것 지원금 받는다는 생각에 살포시 미소를 띠는 주민들을 보며 마음이 저며 온다. 당당히 받을 지원금이라지만 이딴 거 말고, 그저 농산물값 걱정 없이 마음 편히 풍년농사 지어서 스스로 뿌듯한 농심을 마음껏 품어보는 것은 과한 욕심일까.
농사는 하늘의 뜻이라 했다. 농사를 천하의 근본이라 여기지 않는 정치와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인간의 만용이, 결국은 하늘마저 농민을 저버리게 만들었다.
“다음 주에 태풍 온댜.”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뒷전에서 한 어르신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추석을 앞둔 초가을, 농심은 무겁고도 어지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