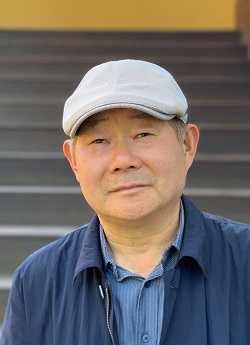
서기 2001년 4월 어느 날, 강화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외포리 포구에서 관광객들에 섞여 석모도 가는 카페리 여객선을 탔다. ‘배를 타고 여행했다’라고 말하기엔 좀 낯간지러운 거리였다. 금방 올라탔는가 싶었는데 20여 분만에 석모도 선창에 닿아버렸으니.
그 섬의 남쪽 해안선을 따라 보문사 방향으로 달려가다 보니, 왼편에 경지 정리가 아주 잘 된 듯 보이는 들판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곳은 농작물을 가꾸는 전답이 아니라 소금을 일궈내는 소금밭이었다. ‘고기가 떼를 지어 노니는 어촌’이라 하여 어유정(魚遊亭)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 마을은, 예부터 맛 좋은 소금의 생산지로 이름을 드날려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유정 마을의 염전은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내가 찾아갔던 그 해(2001년)를 끝으로 염전으로서의 구실을 마치고 폐쇄될 것이라 했다.
“바닷물이 한강물과 합수하는 지역이라 물맛이 다른 곳보다 짜지 않아요. 다른 데서 생산한 소금은 입에 넣고 깨물면 씁쓸하지만 여기 소금은 단맛이 나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에도 주머니에 소금을 넣고 다니면서 안주로 먹었다니까요. 새우젓을 담가도 어유정 소금을 쓰면 맛이 달라요. 정말이에요. 예전에 인천에 갖고 나가면 어유정 소금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아, 그런데 이 단맛 나는 소금을 맛 볼 날도…이젠 끝이지요 뭐.”
달고 맛난 ‘어유정 소금’의 맥이 끊기게 되어 못내 아쉽다며 감회에 젖는 이 사람은 석모도 토박이인 노상우 할아버지(1930년생)이고.
“내가 20년 전에 마흔 살 나이로 여기 석모도에 들어와서 염부(鹽夫)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환갑을 넘겼네요. 돌이켜보면 참 힘든 세월이었어요. 소금을 만들려면 우선 소금밭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바닷물을 가둬두려면 사방 가장자리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죽 둘러서 둑을 쌓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면 흙이 필요하지요. 요즘이야 우마차로 흙을 운반하지만 그때만 해도 지게 등짐을 하거나 목도로 날랐거든요. 그 뙤약볕 아래서…. 아이고, 그런 중노동을 다시 하라면 차라리 죽고 말지요.”
이제 내년이면 어유정 염전의 폐쇄와 함께 자신도 그 진저리나는 염부 일을 그만둘 거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경상도 안동 출신의 권국선 씨(1940년생)다.
특히 권 씨는 왕년에 충청도와 경상도를 누비며 소금 장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바, 이제부터 석모도 어유정 소금밭의 마지막 염부인 권국선 씨와 이 마을 토박이 노인 노상우 할아버지의 증언을 바탕으로, 염전 일꾼들의 애환과 소금장수들의 갖가지 사연들을 더듬어 보려고 한다.
기억력이 어지간한 사람이면, 2000년대 초입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왕건의 장인이자 나주 지방의 호족인 오 씨가 일꾼들을 지휘하여 가마솥에서 소금을 달여 내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석모도 해안에서도 천일염전이 조성되기 이전인 해방 직후까지만 해도, 드라마 속 그 후삼국 시대의 방법과 다름없는 재래식 제염법으로 소금을 생산했었다는 것이 어유정 토박이 노상우 할아버지의 증언이다. 그렇다면 바닷물을 그냥 길어다가 가마솥에 붓고 끓이기만 하면 소금이 생성되었을까?
“어이구, 그렇게 간단히 소금이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다 하게요. 일꾼들이 짊어지고 와서 가마솥에다 붓는 그 물은, 이미 바닷가에서 열흘이상의 증발과정을 거친 농축된 소금물이에요. 그걸 흔히 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수를 만드는 작업이 또 여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겠지. 세상에 쉬운 일은 없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