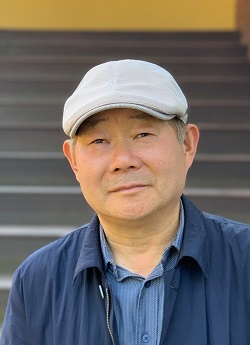
지금이야 전국의 여러 대학에 기상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어서 전문 기상요원들이 갖춰야 할 학문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관상대 부속의 양성소가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공식 명칭은 ‘중앙관상대 기상기술원 양성소’였다.
그 양성소에서는 기후학, 물리학, 관측학, 지학(地學) 등의 전문 과목과 일부 교양과목을 가르쳤는데 6개월간의 단기 과정이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5급(현 9급) 기상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1960년대에 그 양성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 기상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상청 퇴역 예보관 김흥수 씨다.
그렇다면 가령 19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반 무렵의 기상예보 수준은 어떠했을까?
“6.25 전쟁 이전까지는 중국으로부터 기상 자료를 제공받아 왔는데, 전쟁이 터지자 당장 중국이 자료제공을 끊어버린 겁니다. 기상자료도 전쟁 기밀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나라 서쪽 지역의 기상상황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예보관들이 애를 먹었지요. 그뿐이 아녜요. 관상대에서 나름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일기에 대한 정보를 산출했다고 해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제법 부자로 산다는 집을 빼놓고는 라디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측후소의 지붕에다 깃발을 달아서 날씨를 알렸다.
-오다 보니께 측후소 지붕에 퍼런 깃발이 올랐더라고. 내일은 비가 오기는 올 모냥이제?
-아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 보름 동안이나 뻘건 깃발만 나부껴서 애를 태우더니….
맑겠다, 흐리겠다, 비오겠다, 등을 빨강‧회색‧파랑의 깃발로 표시해서 알렸던 것이다.
기상요원 양성소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시했던 과목은 전문(電文)을 작성하고 해독하는 요령이었다고 김흥수 씨는 얘기한다.
“우리나라 각 지방에 기후상황을 관측하는 측후소들이 있어요. 이 측후소에서 관측한 내용들을 중앙관상대에다 보고를 해야 하는데, 모든 정보를 숫자로 암호화해서 전문을 작성한 다음에 보고를 하지요. 가령 60부터 69까지는 비에 관한 암호들인데 61이면 비가 조금 오는 경우고, 65 정도 되면 비가 꽤 많이 오는 경우, 그리고 맨 끝의 69는 비가 동이로 퍼붓듯이 쏟아지는 경우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 다음으로 바람의 경우에는….”
김흥수 씨의 첫 발령지는 울산측후소였다. 측후소에서 그가 한 관측업무는 대개 이런 내용들이다.
“먼저 하늘 상태를 보지요. 하늘이 맑은지 흐린지, 흐리면 구름이 몇 할 끼었는지를 측정해요. 또 안개가 끼었는지, 끼었으면 시정(視程) 거리는 몇 미터나 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 다음엔 백엽상(百葉箱, 온도와 습도 측정 장비가 설치된 작은 집 모양의 백색 나무 상자)의 문을 열고 온‧습도를 체크해요. 맨 나중으로는 측후소마다 마련돼 있는 기압계실(氣壓計室)에서 기압을 측정하는데, 울산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면기압도 측정을 해야 하고….”
해면기압(海面氣壓)은 바다 표면, 즉 해수면의 기압을 말한다.
이 모든 관측결과를 모두 숫자 암호로 바꿔서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문을 작성한다’고 얘기한다.
신입직원 김흥수는 작성된 전문을 들고 우체국으로 뛰어간다. 중앙관상대에 그 숫자암호를 송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화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때에는 전보로 송신을 했다. 그래서 당시 지방측후소에 근무하던 기상요원과 우체국이나 전화국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에 사랑이 싹터서 부부가 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