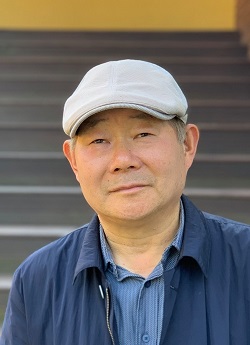
봄이 왔다. 궁핍의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도 그러했듯이, 화성자혜원에 수용된 전쟁고아들에게, 봄은 약동하는 계절도 희망을 상징하는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저 힘들게 넘어 채야 하는 보릿고개였다.
고아원의 살림살이가 핍진한 형편이다 보니 아침엔 꽁보리밥을 먹고, 점심은 옥수수가루 풀죽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에는 수제비를 먹는 식으로 간당간당 끼니를 이어갔다. 그러다보니 원생들은 늘 허기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봄이었다.
고아원이 위치한 용주사 근방에 사도세자 부부가 묻힌 융릉(隆陵)과, 그의 아들 정조와 효의왕후를 합장한 건릉(健陵) 등의 문화유적지가 있는 탓에, 봄이 되면 단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주말이 되면 원생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얘, 상열아, 저 사람들 지금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 꺼내는데, 얻어먹으러 가지 않을래?
-달라고 했다가 안 주면…창피하잖아.
-바보야, 왜 우리가 창피해, 달래도 안 주는 사람들이 창피하지.
-그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뭐, 하여튼 가보자.
처음엔 쭈뼛거리며 제대로 입을 떼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이력이 붙으면 마치 맡겨 놓기라도 한 양 손을 벌리게 되더라고 이상열 씨는 얘기한다. 어쩌다 마음씨 좋은 단체 행락객을 만나 도시락 하나를 얻어먹을 때면 그 맛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 했다.
“그 땐 서울에서도 좀 산다는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놀러 다녔잖아요. 단체로 오면 도시락을 여유 있게 준비하거든요. 일식집에 주문해서 갖고 온 일회용 펄프 도시락 하나를 얻어서 뚜껑을 딱 열면 야아, 먹기도 전에 눈이 뒤집힌다니까요. 초밥에다 생선구이에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음식을 얻어먹다가 고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는 날이면 엉덩이에 불이 날 각오를 해야만 했다.
“고아원에서 나온 감시원이 숨어서 얼굴을 봐뒀다가 저녁에 호출을 해요. 거지새끼들처럼 구걸이나 하러 다닌다면서…매 맞을래, 아침밥 굶을래, 하고 물어요. 아이들이 다 매 맞겠다고 하지요. 뒷날 군대에서 맞을 ‘빠따’를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미리 다 맞았어요.”
고아원 원생들에게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혹은 아주 나이가 어린 원아가 아니면, 놀고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남자 원생들에게는 산에 가서 땔감을 해 와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힘든 노역이었다. 아이들이 메고 다닐 지게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가마니에다 새끼줄로 멜빵을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는, 철사를 구부려서 만든 갈퀴를 들고 뒷산을 올랐다. 여남은 살 안팎의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산에 오르자마자 하는 일은 따로 있었다.
-진수 형, 우리 고기 구워먹자. 내가 불 피울 테니까 형이 잡아와.
“여름이나 가을철이면 사방에 개구리가 지천이었어요. 개구리 뒷다리를 손으로 잡고 몸통을 발로 밟은 다음에 세게 잡아당기면 살이 붙은 뒷다리가 쏙 빠져나와요. 고놈을 구워 먹는 거지요. 소금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거든요.”
해가 서녘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부리나케 갈퀴질을 해서, 마른 솔잎으로 가마니를 빵빵하게 채운다. 돌아가 나뭇짐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한밤중에라도 다시 산에 올라야 했다.
“여남은 살 어린 동무가, 갈퀴나무로 가득 채운 가마니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뒤따라가면서 바라보면 웃음이 나와요. 몸뚱이는 안 보이니까, 네모진 가마니가 다리가 달려서 걸어가는 형상이거든요. 지금이야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