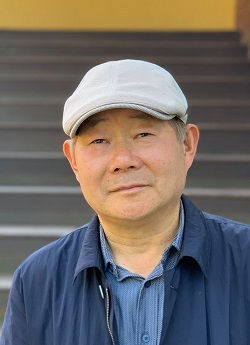
자신이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편지에 썼으면서도, 막상 해외 펜팔 대상자인 미국의 여학생으로부터 사진을 전해 받고나니, 바야흐로 고등학생 장수남의 고민이 깊어졌다.
‘야, 이런 저택에서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운동장만한 잔디 정원에다 수영장에다…. 그런데 우리 집 사진을 어디서 찍어야 하나….’
피츠버그에 산다는 그 여학생의 저택 사진을 보고 나니, 아무래도 자신의 집을 다른 데서 찾아봐야 할 것 같았다. 지금 살고 있는 길음동의 두 칸짜리 슬레이트집을 ‘우리 집’이라고 내보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동네 사진관에서 카메라를 빌려 들고 나선 것이다. 며칠 뒤, 장수남이 사진을 찾으러 간다.
-아저씨. 잘 나왔어요?
-응. 사진이야 잘 나왔지. 그런데 여기가…어딘가? 무슨 궁궐 같은데?
-경복궁에서 찍은 건데, 왜요?
-아니, 츄리닝 바람으로 고궁 나들이를 했다는 말이야? 이 친구 취미 한 번 별나네.
“장수남이라는 제 친구 얘깁니다. 여학생이 피츠버그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고는, 자기 집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운동복 차림으로 고궁에 가서 찍은 거예요. 경복궁 후원이 자기 집 정원이라 소개하고, 하하. 그뿐인 줄 아세요? 어떤 친구는 조선호텔에 가서 풀장을 촬영해서는 자기 집 수영장이라 속이기도 했다니까요. 이건 여동생한테 들은 얘긴데요, 영국 남학생하고 펜팔을 하던 동생의 친구는 영화배우 윤정희 사진을 자기 사진이라고 보냈대요.”
PC통신 동호회 회원인 박호일 씨의 얘기다.
그러나 영어 실력과는 관계없이 해외 펜팔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1970년대 중반만 해도 국제 우편물은 서울 중앙우체국에서만 취급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품버리고 찾아가야 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우편요금이 2,000원에 달했는데, 그 돈은 좀 산다는 가정 출신의 고등학생이 한 달 내내 써야 할 용돈과 맞먹었다.
당시 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사들이 학생들의 해외펜팔을 바라보는 시각도 일정하지는 않았다. 유럽에 사는 여학생과 펜팔을 했다는 강필규 씨는 영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된통 야단만 맞았다는데.
“영작을 대충 해서 영어 선생께 보여드렸다가 꿀밤만 맞았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김진희 씨의 고교시절 영어 선생님은 달랐다.
“선생님이 영어공부 열심히 한다고 오히려 칭찬을 하시면서 적극 권장을 하셨어요. 편지 쓰는 거 도와주기도 하시고요.”
한편 해외 펜팔을 하다 보면 문화가 서로 달라서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온 영문편지를 해석해 달라며 선생님께 건넸다. 선생님이 느릿느릿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낭독을 한다.
-지난번에 보내준 당신의 편지와 사진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으음…나는 열아홉 살인데,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 명은 죽고 지금은 한 명의 아내와 같이 살고 있으며…
학생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박장대소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했다.
-한국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당신이 우리나라의 종교로 개종을 할 수가 있다면 당장 나에게 와도 좋습니다. 오면, 소 한 마리와 낙타 한 마리를 당신의 부모님에게 보내 드리고, 당신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김진희 씨가 들려준 얘기인데…꾸며낸 말 같지는 않다. 해외 펜팔, 그렇게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