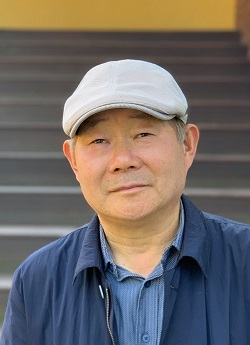
2001년 12월의 어느 주말, 동해안의 한 콘도미니엄 객실에 삼사십 대의 중년 남녀 10여 명이 빙 둘러앉았다. PC통신 천리안의 문화유산 답사 동호회 회원들이다. 둘러앉은 한가운데에다 초등학생 책가방만큼이나 큰 방송용 다트(DAT) 녹음기를 켜두고서, 내가 그들에게 주문한 건 소싯적의 펜팔 경험담이었다. 그런데 저마다 목젖너머에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듯, ‘펜팔’이라는 화두를 던져놓자마자 5일 장터 튀밥 터지듯 왁자하게 쏟아져 나온다. 뭣이 그리도 재밌는지 박장대소가 끊이지 않는다.
여자1: 펜팔 편지는 대개 이렇게 시작하지요. (편지 낭송 투로) 미지의 그대에게…
회원들: (폭소 터트리며 맞장구) “그렇지, 미지의 그대!” “맞아, 상대방 이름은 다 ‘미지’였어!” “소년도 소녀도, 처녀도 총각도 ‘미지’ 아닌 사람이 없었거든!”
여자2: (눈감고 꿈꾸듯) 지난번 편지에 적어 보내주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는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이 밤, 창밖엔 어둠이 고독처럼 밀려들고…(회원들 쿡쿡거리며 웃는다).
남자1: 편지를 벌건 대낮에 써놓고도 괜히 ‘몇 월 며칠 새벽 두 시, 당신의 영원한 벗으로부터’ 이렇게 적는단 말이지.
회원들: (다시 폭소) “맞아 맞아” “많이 해본 솜씨야” “저 수작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펜팔 세대’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면, 평균나이가 40세쯤(2001년 당시) 되는 이 동호회 회원들은 아마도 그 끝물을 경험한 세대라 할 만하다. 펜팔을 통해서 이성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으면서도, PC통신이니 인터넷이니 하는 첨단의 통신체계를 대단히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옛 시절의 펜팔에 얽힌 얘기들을 이 사람들로부터 들어보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펜팔(pen pal)이라는 외래 말은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라는 뜻이므로 ‘펜팔을 한다’는 표현은 좀 어색할 수 있을 터이나, 그 시절 우리들에게는 펜팔이라는 말이, 이른바 ‘미지의 벗에게’ 편지 쓰는 행위 일체를 나타내는 말로 통했다.
1960년대 말 혹은 70년대 초반 무렵의 남자 고등학교 교실. 쉬는 시간에 누군가 가져온 <여학생>이라는 잡지를 서로 던지고 뺏고 하느라 난리법석이다. 드디어 잡지를 차지한 학생이 책상위에 올려놓더니, 서둘러 맨 뒤쪽을 펼친다.
-나도 주소 하나만 베끼자. 김춘자라…이름이 좀 촌스러운데.
-이소영? 얜 주소가 제주도다! 취미가 뜨개질이라는데?
-잘 하면 이번 겨울에 바다 건너온 털장갑 한 켤레 얻어 끼겠는데?
-야, 꿈 깨라. 너 그 지렁이 기어가는 필체로 백 날 편지 써봐라. 답장이 오나.
“잡지들마다 맨 뒤쪽에 펜팔 희망자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시절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잡지는 <학원>하고 <여학생>이었지요. <학원>엔 남자애들 주소가 월등히 많았지만 <여학생>에는 상대적으로 여자애들 주소가 많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 인기 있는 <선데이 서울>이나 <주간경향>의 펜팔 코너에도 여자 주소는 남자의 5분의 1도 안 됐어요.”
‘펜팔시장’의 수요공급이 이렇듯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 남자들에겐 썩 불리한 게임이었다. 그러니 그 날 주소를 적어간 남학생은 ‘까만 밤을 하얗게 태우며’ 편지지와 씨름을 할 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