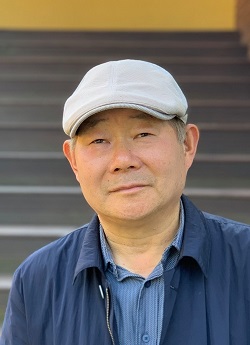
1969년, 청계천의 무허가 판잣집들을 철거한 자리에 7층짜리 아파트 24개동이 들어섰다. 삼일고가도로가 그 해 3월에 완공되었고, 그 고가도로 옆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름도 ‘삼일시민아파트’가 되었다.
철거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은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시민 부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빌려주고, 그 곳에다 건물의 외형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가 서울시의 몫이었고, 내부에 칸막이를 하고 문짝을 달고 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했다. 그 부담액이 40만원이었다는데 매월 2,000원씩, 20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아파트의 내부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이삿짐을 들이려는 입주자와 아파트의 관리임무를 맡은 시청 공무원이 단지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인다.
-아니, 아주머니, 지금 리어카에다 뭘 싣고 오시는 겁니까?
-보면 몰라요? 나, 여기 13동 5층 8호 주인인데, 보다시피 이사 오는 길이오.
-허허, 참. 지금 5층 8호는 내부 공사를 하나도 안 했고 문짝도 안 달려 있는데, 텅 빈 콘크리트 바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겠다고 그러세요?
-맨바닥이라도 상관없어요. 뚝섬에서 천막치고 살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왔다니까요.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 중, 완공될 때까지 지낼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관문마저 달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삿짐을 들이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그때 그야말로 ‘억지 이사’를 했던 할머니의 회고담을 들어보니 이렇다.
“도저히 오갈 데가 없어서 세간 몇 가지 리어카에 싣고 와서는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갔지요.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하루는 미장이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다음 날엔 구들 놓는 일꾼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그 담엔 문짝 다는 사람 오고, 페인트칠하는 사람 오고…우리 식구는 이 방에서 공사하면 저 방으로 가서 끓여먹고, 심지어는 아직 입주 안 한 옆집으로 피해 있다 오기도 하고 그랬지요.”
드디어 부엌 바닥에 타일 붙이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내부공사가 완공되었다.
“애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그 동안 철거민으로 떠돌다 보니 집이 생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나 봐요. 정말 우리 집 맞느냐고, 이제 딴 데 어디로 이사 안 가도 되느냐고, 선생님 가정방문 오시라 해도 되느냐고 자꾸 묻는데…아이고, 지금도 그때 일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어느 날엔 남편이 동대문시장에서 화분을 사들고 와서 방문 밖에다 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름이 ‘베란다’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줬는데 아무리 외워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요.”
삼일시민아파트에는 안방과 작은방이 따로 있었고, 연탄불을 땔 수 있는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도 내부에 있었으며(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인근의 낙산시민아파트의 경우 화장실이 바깥에 따로 모여 있었다), 천장에는 ‘꿈같은’ 다락방도 있었다. 열한 평의 좁은 공간을 가르고 쪼개서 만들어 놓은 요술 같은 집이었다.
이름은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그 할머니는, 처음 시민아파트에 입주했을 때의 감격을 평생 잊지 못 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여태 ‘무허가 시민’으로 떠돌다가 거기 살아도 좋다는, 허가 난 집에다 처음으로 가장의 문패를 걸었으니, 모처럼 특별시민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 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