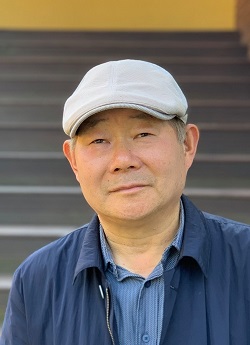
서울의 창신동 언덕바지를 타고 오르면 낙산(駱山)이라는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1960년대에는 그 일대가 또 유명한 ‘하꼬방촌’이었다. 나는 수소문 끝에, 그곳의 무허가 판자동네에 살다가 초기에 낙산시민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0년 뒤 철거될 때까지 거주했던 한 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 1934년생 유재근 할아버지다.
“군(軍)을 제대했지만 시골에서 뭐 해먹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지게품팔이라도 하자, 하고 상경한 때가 1950년대 말이었어요. 그땐 봉천동이니 어디니 하는 데는 가봤자 이미 사람들이 다 터를 잡고 있어서 판잣집마저 들어설 공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낙산은 거의 공지(空地)였거든요. 아카시아나무만 무성했어요. 더러는 아름드리에 키가 40여 미터나 되는 놈도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서는 무허가 판잣집을 짓기 시작한 거요.”
그렇게 한 집 두 집 들어선 것이 거대한 하꼬방촌을 이루었고, 하룻밤 자고나면 10여 채의 집이 들어설 정도로 그 수가 늘어갔다.
전라도 남원 출신의 유재근 노인이, 먼저 상경해 있던 사촌형과 서울역 시계탑 아래에서 만나 나눈 대화는 이러했다.
-서울 온지 꽤 됐다면서 요새 뭣을 하고 돌아댕기는 것이여?
-저기 보광동에다 쬐끄만 셋방 하나 얻어놓고 건설현장에 막노동 댕기고 있는디.
-미친 놈. 하루 벌어서 하루 묵기도 바쁜 놈이 뭔 놈의 방세를 줘가면서 산단 말이여.
-그래도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응께….
-당장 나 살고 있는 창신동으로 와. 그라면 내가 집 한 채 지어줄 것잉께.
-집을 어떻게 짓어? 돈이 있어야 말이제.
-브로크 몇 장하고 판자때기만 있으면 다 짓는 방법이 있어. 기둥은 내가 벌써 세워 놨다.
유재근은 집 한 채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촌형의 얘기에 솔깃해서 따라나섰는데, 창신동 언덕배기 들머리에 도착하자마자 요란한 폭음과 함께 바윗돌 무너지는 소리가 진동했다.
-놀랠 것 없어. 여그가 돌산이거든. 채석장 사람들이 남포를 터트린 것이여.
아래쪽에서는 채석장 업자들이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 돌을 깨는데, 그 바위산의 벼랑 위쪽으로는 무허가 판잣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참으로 아슬아슬한 형국이었다. 물론 얼마 뒤, 판자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발파작업이 금지되긴 했다.
집짓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촌형이 미리 세워놨다는 ‘기둥’이란 퍼렇게 살아있는 아카시아나무를 이름이었다. 적당한 간격의 나무 두 그루를 기둥 삼고, 시멘트블록을 바닥에 깔고, 판자때기로 뚜덕뚜덕 벽을 세우고, 지붕에 루핑을 씌우고 나니…반나절 만에 집 한 채가 뚝딱 완성되었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드럼통을 구해 땅에 묻어서 화장실까지 마련했다. 유재근의 낙산 하꼬방 시절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1969년 봄, 낙산 하꼬방촌에도 철거 바람이 불어 닥쳤다. 하지만 모두를 철거할 수는 없었으므로, 시민아파트를 지을 부지만큼의 판잣집들만 철거대상이었다. 그들이 트럭에 실려 옮아간 곳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모란지역이었는데, 가구당 판잣집 한 채를 세울 수 있는 면적의 땅 한 뙈기씩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떠난 자리에 들어선 낙산시민아파트에 입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아파트를 짓는 기간 동안만 임시로 뚝섬으로 옮겨 살았던 청계천 이주민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강제이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