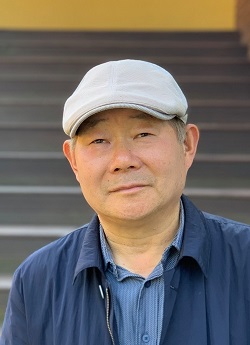
1965년 봄, 광주시 학동의 일선이발관.
난생 처음 정장을 차려입은 스무 살 청년 김호면이 이발소의 대형 거울 앞에 섰다. 이발소 주인이 김호면의 넥타이며 옷매무새를 손봐주며 뿌듯해 한다.
- 야, 그렇게 차려 입으니까 3년 전에 세상 떠난 명카수 남인수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야. 멋지다, 김호면 이발사! 자, 차 시간 늦기 전에 얼른 출발해야지. 부모님 좋아하시겠다.
김호면처럼 이발관의 꼬마로 들어가서 기술을 익힌 끝에 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주인이 양복 한 벌을 맞춰 입혀서 고향에 보내주는 것이 60년대 이용업계의 관행이었다. 이발소 주인들의 마음씨가 특별히 너그러워서라기보다는 그 동안 공으로 부려먹은 데 대한 작은 보답인 셈이었다. 이 의기양양한 스무살 청년이 이발사 자격증을 손에 쥐고서, 전기도 안 들어오던 궁벽한 고향 마을에 양복을 차려 입고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부지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양조장에다 막걸리를 한 섬(열 말)이나 주문해서 동네사람들한테 풀었다니까요. 햐아, 참, 대통령이 된 기분이었어요.”
면허증을 손에 쥔 김호면이 이발소를 개업한 곳은 나주군 다시면 송촌리라는 시골 마을이었다. 나이든 선배 이발사와 동업으로 차렸는데, 기차역 근방이라 목이 좋아서 날마다 콧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뿐 아니었다.
“당시 이발사는 시골에서 최고의 신랑감이었어요. 이발소에 온 손님들이 다투어 사위 삼자고 탐을 내고, 사방에서 연애편지가 날아들고… 인기 좋았지요. 그땐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설극장이 들어왔는데, 저녁에 처녀들을 둘씩 셋씩 거느리고 영화구경 가고 그랬다니까요, 허허.”
김호면 씨의, 잘 나가던 소싯적 자랑이 이어진다. 어느 날 가설극장에서 영화를 구경하고 귀가하던 길에, 그는 마음에 두었던 한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 다음 구경 올 땐 다른 가시내들 줄줄이 달고 나오지 말고 송민자 너 혼자만 오랑께.
- 그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아부지한테 다리 몽댕이 분질러질라고? 우리 아부진 하늘이 두 쪽 나도 철도 공무원한테 시집보낼 것이라고 했는디.
- 느그 아부지가 우리 이발관 단골 손님인디 뭣이 걱정이냐. 두고 봐라. 다음에 이발하러 오시면 “장인어른, 딸 나한테 주시오” 그럴 것잉께. 이발사를 뭘로 보고….
결국 철도 공무원의 딸과 총각 이발사는 부부가 되었다.
이발사들은 70년대 중반, 장발 풍조가 거세게 밀려닥쳐 극심한 불황에 허덕였던 때를, ‘이발 업계의 IMF 시기였다’라고 공공연히 회고한다. 당시만 해도 일회용 면도칼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는 멋대로 기르더라도 면도는 꼬박꼬박 이발관에 찾아와서 했다는데, 젊은 손님들 중엔 얄밉게도 머리는 자르지 말고 면도만 해달라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장발바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불심검문 풍경을 떠올려보면 쉽게 짐작할 거요. 순경이 버스에 올라서 승객들을 죽 훑어보다가, 머리를 요즘 식으로 단정하게 자른 청년이 보이면 대뜸 다가가서 신분증 좀 봅시다, 그랬다니까요. 간첩 아닌가 해서…. 뭐, 다 옛날 얘기지만.”
서기 2000년 11월 30일, 나는 인천 계양구의 인정이발관에서 주인인 그를 만났는데, 한나절 내내 김호면 씨와 나의 얘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