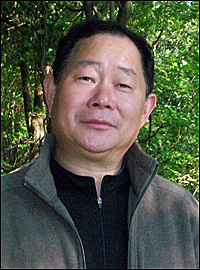
나일론 줄이 대중화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물건의 포장 혹은 결속 수단이 새끼줄이었으므로 집안에 늘 여분의 새끼를 갖춰놓아야 했다. 들판에 곡식을 거두러 갈 때나 산에 나무하러 갈 때에도 낫과 지게와 함께 새끼줄 서너 발을 챙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경우 말고도 연중행사 중에 매우 많은 새끼가 소용되는 때가 있었다. 가령 초가집 지붕을 잇는 경우 등인데 지붕갈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새끼는 하루 이틀 꼬아서 될 분량이 아니었다.
“오늘 저녁에는 춘식이네 사랑방에 새끼 꼬러 가야 하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네.”
볏짚과 손바닥만 있으면 된다 했지만 사실 새끼를 제대로 꼬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짚단을 가져다가 마당 한 귀퉁이에 놓고, 볏단의 아래 부분을 절구 공이로 잘근잘근 짓찧은 다음, 손가락을 갈퀴 삼아 훑어 내리면 검불이 빠져나가고 알짜배기 볏짚만 남는다. 그 짚을 다시 묶어서 짚단의 아랫도리를 물에 담가두면 준비 끝이다.
이른 저녁을 먹고 준비해둔 짚단을 가지고 춘식이네 사랑으로 간다. 이미 대여섯 명이 와서 자리를 잡았다. 본격적인 새끼 꼬기가 시작되었다. 삭삭삭삭, 쉐쉐쉐쉐, 사각사각사각…. 꼬는 사람의 연륜이나 버릇이나 숙련도에 따라 저마다 소리가 달리 난다. 새끼를 꼬는 일은 지극히 단순한 작업인 탓에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작업 중인 사랑방에 대화가 만발한다.
“금년 봄에는 모풀(못자리에 거름으로 넣는 풀)을 좀 낫이 넣어줘야 쓰겠어.”
“농협 비료 값이 솔찬이 밀려서 금년엔 일부래도 갚어야 할 것인디 큰일이구먼.”
“영출이 자네 딸 여울 때 안 됐능가?”
“큰 동네 병식이 말이여, 아, 글쎄, 노름해서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네.”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면 엉덩이 뒤로 빼놓은 새끼줄이 제법 수북이 쌓인다. 너무 많이 쌓이면 엉킬 수가 있으므로 중간 중간 작업을 쉬고 새끼줄 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몇 발 안 되는 새끼를 사릴 때에는 왼손의 손아귀와 팔꿈치에다 둘둘 감으면 되지만, 그 양이 많을 때는 양반자세로 앉은 다음 양쪽 무릎을 둘러 감는 방식으로 ‘새끼 사리’를 꾸리면 된다.
작업을 잠시 쉴 때쯤 춘식이 아내가 양푼 둘을 사랑으로 들인다. 한쪽에는 찐 고구마가, 또 한 양푼에는 배추김치가 포기 째 담겨 있다.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김치가 소태처럼 짜다는 사실이다. 김치를 사랑방에다 대량공급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짠 김치 먹으면 물을 켤 것이고, 물을 켜다보면 오줌을 자주 눠야 한다. 오줌을 참았다가 집에 가서 누는 사람은 예의 없는 사람이다. 사랑방을 나가 뒤란으로 돌면 귀퉁이에 옆구리가 깨진 큰 항아리가 놓여 있다. 거기다 오줌을 눠야 한다. 비료가 귀하던 시절, 그 암모니아 배출수야 말로 요긴한 비료였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