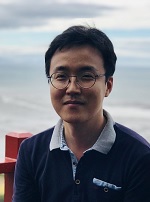
열 살이 채 되기 전의 얘기다. 학교에 갈 때 나는 이틀에 한 번 500원의 용돈을 받았다. 그 500원을 가지고 이틀에 걸쳐 판박이가 든 풍선껌을 씹고, 초코우유를 마시고, 스티커가 든 봉지과자도 먹었다. 가끔씩 초코파이보다 두 배 비싼 몽쉘통통을 먹는 호사를 누리더라도, 저금통에 들어갈 동전 한 닢은 충분히 남았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이따금 카트에 꽂혀있는 동전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동전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트에선 카트 뽑는 일밖에 없다. 200원짜리 봉지과자는 1,200원이 됐고, 100원짜리 껌 한 통도 700원이 됐다.
그런 과자값이 이번에 또 인상되고 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씩 10%씩 쑥쑥 오르는 모습에 배알이 꼴린다. 기업들 잇속에 신물이 나서가 아니다. 과자값이 뒤도 안돌아보고 올라가는 동안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제자리에 매여 있는 쌀값이 눈에 밟혀서다.
공장에 딸린 단칸방에 앉아 천정에서 새는 빗물을 받았던 그 시절에도 쌀이 떨어져 흰밥을 거른 기억은 없다. 형편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던 우리 가족에게도 쌀값은 크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물며 25년이 지난 지금, 작년보다 쌀값이 좀 올랐다고 하는 올해에도 그 시절과 비슷한 20kg 3만원대의 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쌀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는 상식적인 요구가 이렇게 묵살된다. 거침없이 오르는 과자값이 부러워서, 쌀값을 과자값에 연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한가한 생각까지 든다. 과자값 아니라 짜장면값, 버스비, 옷값, 세상 어떤 가격이든 연동만 한다면 농민들은 대환영일 터다. 그만큼 이 나라 경제에서 유독 소외된 게 농민들이다.
물가가 오르는 한 쌀값도 당연히 올라야 한다. 수십년째 쌀값이 제대로 오르지 못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농민들의 편익을 가로채 누려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쌀값 상승을 견제하는 세력들도, 그들의 눈치를 보는 정부 여당도, 과자값을 올리는 생산업체들도, 그것을 사먹는 우리들도 모두가 농민들을 짓밟고 서 있다는 죄책감을 자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