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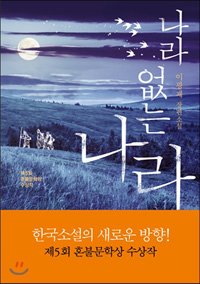
‘같은 나라’를 꿈꾼 이들이 있었다. 인간평등이 실현되고, 사회비리가 척결되며, 외국 침략세력을 내쫓아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를 꿈꾼 이들이 있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의 깃발을 들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농군들은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뼈 속 깊이 새기며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무참히 스러지고 만다.
혼불문학상 다섯 번째 수상작, 이광재 작가의 장편소설 「나라없는 나라」는 오늘날 다시 ‘동학농민혁명’을 불러온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발부터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을 고전적인 문체로 그려낸 소설에선 1894년 당시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로부터 핍박받던 농군과 민초들의 이야기가 생생히 살아 움직인다.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혁명을 이끈 장군들과 을개, 갑례, 더팔이 등 민초로 표현되는 주변인들의 삶과 죽음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어우러져 가슴 아프게 펼쳐진다. 다른 한 축에선 일본과 청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흥선대원군과 그를 둘러싼 젊은 관리들 이철래, 김교진 등의 삶이 씨줄날줄처럼 얽힌다.
작가는 책 말미에 밝힌 작가의 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안락을 꿈꾸지만 당장은 안전해 보여도 제도화된 위태로움으로부터 조만간에는 포위될 게 뻔하다”며 “단언컨대, 세상은 지금 안전하지 않다. 사람, 산과 강, 저녁거리, 지역, 국가 모두가 위태롭다”고 선언한다.
이어 “갑오년에 쏜 총알이 지금도 날아다니기 때문”에 다시 그날의 일을 소설로 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든 일례로, 일본을 추종하던 세력과 기득권 세력이 친일파가 되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갑’이 되어 현재의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세상이 돼버렸다고 일갈한다.
결국 「나라없는 나라」는 동학농민혁명이 올바른 역사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던 반외세의 자주독립과 반봉건의 민주화가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고발하며 위태로운 사회에 포위된,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추동한다. 이는 에필로그에서 작가가 맺는 대화와 일맥상통한다.
- 선생님, 저 재를 넘으면 무엇이 있습니까요?
<중략>
- 아니다. 재는 또 있다.
- 그럼 그건 어쩝니까요?
- 그냥 두어도 좋다. 뒷날의 사람들이 다시 넘을 것이다. 우린 우리의 재를 넘었을 뿐. 길이 멀다. 가자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