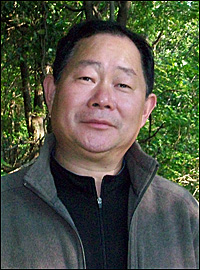
조금 나중의 일이지만, 나는 섬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에 뭍으로 나가 강진에서 중학을 다녔는데, 같은 교정 안에 농업고등학교가 있었다. 중학 2학년 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농고 축산과 선생님과 단짝 친구였다. 어느 날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농고 축산과 학생이 우리 교실 문을 열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축산과 실험실로 오시래요.”
“나를? 무슨 일인데?”
“오늘, 그 거시기, 머시기…그거 까는 날이라고…술 한 잔….”
선생님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고등학생을 서둘러 쫓아 보냈다. 우리는 여드름투성이의 그 농고생이 남기고 간 말이 뭔 소린지 도통 몰랐는데 별명이 ‘연애박사’인 장남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들을 돌아보며 큰소리로 말했다.
“야, 오늘 농고 축산과에서 기르는 뿌락지 불까는 날이라, 그 말이여. 그랑께, 축산과 선생님하고 우리 선생님이 그 소 불알을 안주 삼아서 소주 한 잔, 캬악!”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졌고 우리는 책상을 두드리며 박장대소했다. 수소의 경우 불을 까주면 생식능력을 상실하는 대신에 살이 쪄서 몸이 불어난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래도 중학교 때는 음양의 이치를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풀 뜯겨 키운 소가 ‘시집’을 가던 무렵에는, 암소를 그냥 가만 놔두면 저 혼자 알아서 새끼를 배고 또 낳는 줄만 알았다. 우리가 학교를 오가며 지나는 동네 들머리 우실(외부에서 마을이 보이지 않게 마을 입구에 숲을 조성해 놓은 곳)에는 흥미로운 시설물(?)이 있었다. 나무토막을 가져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에다 허리높이로 가로대어서 ㄷ자 모양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촌형은 그 곳이 소 흘레붙이는 곳이라 하였다. 나는 ‘흘레’라는 말의 어감이 생경하여서 자꾸만 그 말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에 학교에서 돌아오다 보니 외양간에 있어야 할 우리 소가 거기 나와 있었다. 게다가 쟁기질 할 때 빼놓고는 소를 끌고 다녀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 느그 소 흘레붙일라고 끗고 나왔는갑다.”
동무들이 수군거렸다. 드디어 어른들이 우리 소를 그 ㄷ자 안으로 몰아넣고는 움직이지 못 하도록 코뚜레를 붙잡았다. 조금 있으니까 용술이 아버지가 자기 집 뿌락지를 끌고 우리 소의 꽁무니 쪽으로 접근시켰다. 그 뿌락지가 킁킁 냄새를 맡는가 했더니 이윽고 상체를 불끈 솟구쳐서 우리 소를 올라타는 것이었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 용술이네 뿌락지는 덩치가 무지무지하게 큰 반면에 우리 소는 거비 비하면 체구가 작았다. 언젠가 말 타기 놀이를 할 때 몸이 무지하게 뚱뚱한 수남이 녀석이 껑충 뛰어서 내 엉덩이 쪽으로 올라타는 바람에 땅바닥에 나뒹군 적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용술이네 뿌락지는 오래 지체하지 않고 금방 내려왔다. 어른들은 “아그들은 저리 가라!”고 했지만, 나는 그 수놈 소가 우리 집 암소의 엉덩이 위로 올라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른들이 그 일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갯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멈네들’은 바구니를 머리에 인 채 손바닥으로 얼굴 한 쪽을 부러 가리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알듯 모를 듯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흘레’라는 그 일은 남자 어른들만 알아야 하는, 매우 은밀한 의식(儀式) 같은 것임에 틀림없었다. 드디어 아버지는 소고삐를 나에게 쥐여 주고 나서 용술이 아버지에게 몇 장의 지폐를 건네주었다.
사실 이제 와 하는 말인데, 그 사흘 전에 동무 여럿이서 소 먹이러 갔을 때, 뒷산 참나무 밑에서 재평이네 뿌락지가 우리 소를 마음대로 올라타고서 저희들끼리 그 ‘흘레’라는 짓을 하는 걸 나는 보았다. 그러나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이듬해에 태어난 우리 송아지의 아버지는 용술이네 소였을까, 재평이네 소였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