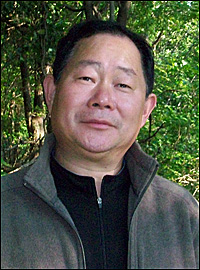
진심으로 한 고백인데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성인 대상의 소설 말고도 동화 창작도 함께 한다는 사람이 설마 그런 삭막한(?) 소년기를 보냈겠느냐, 하는 반응이다.
물론 내가 한 말에는 잘못된 표현이 있다. 나는 동화책을 안 읽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읽었다. 1960년대에 농촌의 빈한한 집에서 소년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당시에는 책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교과서마저 ‘주요과목’인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외에는 구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 시절의 농촌 아이들은 대부분 한글 자모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입학을 했지만 나는 일찌감치 글자 공부를 시켜준 아버지 덕분에, 입학 전에 한글을 더듬더듬이나마 읽을 줄 알았다. 일단 글자를 배우고 보니 재미난 읽을거리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재갑이네 산 들머리에 일정 간격을 두고 한 글자씩 따로 세워져 있던 ‘입-산-금-지’ 팻말을 비롯하여, 고샅으로 나가면 평평한 담돌마다에 새겨져 있던 ‘반공방첩’ 혹은 ‘식량증산’, 비료포대의 ‘충주비료’, 하다 못 해 성냥통의 ‘제비표 성냥’ 또는 ‘남성성냥공업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널린 것이 실사구시의 어학교재였다. 안방의 벽면에 붙어 있던, 정치인의 사진과 함께 열두 달을 한 장에 담은 달력은, 우리들 어린 촌놈들이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수열(數列)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똑 소리 나는 교재였다.
어느 날 나는 비료포대 앞에 쪼그려 앉아 한 시간이 넘게 진땀을 흘렸다. 열흘쯤 전에 어머니를 졸라 어렵게 연실 한 타래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으나 기쁨도 잠시, 연실의 끝을 얼레에 묶지 않고 연을 띄웠다가 아까운 연실을 가오리연과 함께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그래서 궁색하나마 비료포대의 실을 풀어 모아서 연실로 충당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오후에 텃밭 거름을 주겠노라며 비료포대를 마당에 내어놓고 나가자마자 나는 재빨리 고놈에게 달려가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비료포대의 박음질은 매우 신묘하여서, 운이 좋을 때는 실 끝을 찾아 잡아당기기만 하면 도로로록,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풀렸지만 또 어떤 때는 한 나절을 씨름해도 풀리지 않았다. 성질 급한 아버지가 돌아와 낫으로 부욱, 잘라 포대를 열기 전에 고놈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으나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웃집으로 달려가 4학년짜리 형을 불러 왔다. 포대의 실을 풀어달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료포대에 새겨진 이상야릇한 글자 하나를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여그 요것이 뭔 글씬지 한 번 읽어봐.”
“비잉신, 그것도 몰르냐? ‘복·합·비·료’ 아녀.”
“그것 말고 여기 쬐끄만 이것….”
이웃집 형은 내가 가리키는 작은 글자를 보고서 고개를 옆으로 45도쯤 비틀더니 이윽고 무슨 대단한 암호해독을 마친 사람처럼 양양하게 말했다.
“그거, ‘응’이여. ‘응’자라고.”
“‘응’자를 왜 이렇게 삐딱하게 써놨으까? 질소 21응, 인산 9응, 가리 10응….”
내가 비료포대에서 퍼센트(%)라는 외국말의 기호를 처음 접한 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