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절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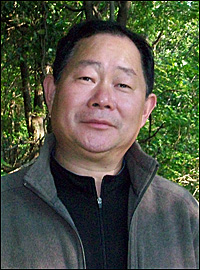
정초가 되면 도회지 가정의 방문 위쪽 벽에 울긋불긋한 장식을 단 조리가 내걸린다. 복을 부른다는 ‘복조리’다. 그러나 조리가 있어야 할 본디의 자리는 문설주 위쪽이 아니라 부엌이다. 그 기능도 쌀을 일어서 돌을 골라내는 구실이었다.
벼를 베어서 논바닥에 널고, 그것을 볏단으로 묶고, 지게나 수레로 운반해서 낟가리로 쌓고, 홀태로 탈곡을 하고, 알곡을 멍석이나 혹은 신작로 바닥에다 널어 말리고, 그것을 다시 정미기로 도정하고…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쌀에 돌이 안 들어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조리질은 대개 어머니나 누이들의 몫이었다. 씻은 쌀을 물에 담근 상태에서 조리로 살랑살랑 물결을 일으켰다가 위로 떠오르는 쌀알을 내꿔 채듯 건져서 다른 용기로 옮기는 방식인데, 손목의 힘만으로 능숙하게 조리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그 빠르고 유연한 손놀림이 신기하기만 하였다. 물론 조리질을 다 마치고 나면 밑바닥엔 거짓말처럼 작은 돌 부스러기나 모래알이 남았다.
그러나 쌀을 이는 데에 반드시 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양이 적을 경우 그냥 바가지 둘만 가지고도 곡식을 일 수 있었다. 쌀을 물에 담근 채 가볍게 흔들어 이 바가지에서 저 바가지로 옮겨가면서 돌을 가라앉히는 방식인데, 거창하게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돌은 쌀보다 비중이 크므로 물에 담가 흔들면 가라앉는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밥에 돌이 없었을까? 아니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다가 누군가의 입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 모든 식구들의 동작이 ‘일시정지’ 상태가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장하는 쪽은 아무래도 밥 짓는 일을 도맡아 하는 어머니다. 가부장적 질서가 엄연한 밥상머리에서 돌을 누가 씹었느냐에 따라 식구들의 반응도 각각이지만, 돌 씹은 당사자의 처리 방식도 갖가지였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요란하게 내뱉은 다음 아예 식사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안에서 혀를 우물우물 놀려서 분리작업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돌만 골라 입술 바깥으로 밀어내어서 슬그머니 상 밑에다 감추는 착한 식구도 있다.
사내 녀석들만 다섯이나 있는 집안의 장남이었던 나는, 더러 바가지로 쌀을 일어서 밥을 짓기도 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철이 일찍 든 편이어서, 내가 씹은 돌 때문에 식사분위기를 흐린 적은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어느 집이든, 꼭 돌을 씹는 사람이 자주 씹는다는 사실이다.
밥 먹다 돌을 씹은 남자가 “여보, 오늘 연탄불이 시원찮았던 모양이네. 돌은 안 익을 걸 보니…”운운했다는 우스개가 유행한 것도 쌀을 일어 밥을 짓던 시절의 일이었다.
오늘날의 탈곡 방식은 볏논에 서 있는 벼를 콤바인으로 바로 거두어서 자루에 담아내는 식이어서, 돌 고르는 기계(석발기)가 아니더라도, 밥에 돌이 섞여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다. 더불어 조리도 제 구실을 잃고 도회지 문설주 위에 장식품으로 밀려났다. 아, 참,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왜 우리 엄니는 밥 먹을 때 단 한 번도 돌을 씹지 않았을까?’

